최근 수해가 난 뒤 대형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됐을 때 생뚱맞게도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를 떠올렸다. 극심한 에너지난에도 불구하고 생태와 환경을 교란한다는 이유로 수력 발전소 계획을 중단한 나라, 바로 쿠바다. 소설가 유재현은 최근 펴낸 쿠바 여행기 <느린 희망>(그린비 펴냄)에서 과연 이 나라가 우리가 찾아 헤매는 '푸른 유니콘'인지를 묻는다.
지속가능한 후퇴? 포기하지 않고서 변할 수 없다!
진정성이 묻어나는 글과 투박한 사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느린 희망>에 비친 쿠바의 모습은 이중적이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이 '악마적인' 경제 봉쇄를 한 후 이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생태적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불가피한 전환'을 유재현의 지인은 다음과 같이 꼬집어다. "지속가능한 후퇴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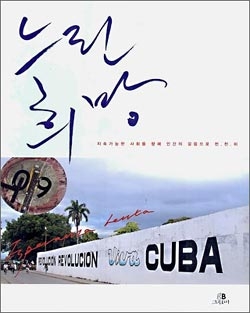
|
그렇다. 쿠바는 1980년대까지는 소련과 동구권의 아낌없는 지원 덕에 에너지, 화학비료, 농약을 들이붓는 미국에 버금가는 '환경 파괴의 나라'였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쿠바가 생태와 환경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쿠바는 살기 위해서 변해야 했다. 일단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인민을 땅과 함께"라는 구호 속에 도시와 근교의 공터, 뒤뜰, 텃밭 등 그 때까지 개발의 그늘에 숨어 있던 모든 땅이 먹을 것을 생산하는 '어머니'로 재발견되었다. 땅이 척박하고 지력이 약한 땅에는 벽돌, 슬레이트, 폐 건자재를 쌓은 후 유기질의 흙을 담은 양육 판을 활용했다.
화학 비료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다. 대신 전통으로 눈을 돌렸다. 수천 년간 써 오던 조상들의 지혜를 빌린 유기질의 비료, 바이오 농약 등이 연구·개발돼 보급되었다. 트랙터 대신 소들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38만5000마리의 소가 4만 대의 트랙터를 대신하고 있다. 결과는? 붕괴 직전의 쿠바는 가까스로 살아났다.
2004년 쿠바의 영양 공급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유재현은 다시 되묻는다. "후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인가? 지속불가능한 발전을 포기하지 않고서야 지속가능한 사회를 일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린 희망' 실현하는 '쿠바의 힘'
<느린 희망>을 읽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경제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쿠바의 힘'을 목격할 때 특히 그렇다. 교육, 복지, 의료 등 모든 면에서 쿠바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우위에 선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유재현의 증언에 무슨 토를 달 것인가?
"한국도 쿠바도 9년의 의무교육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의무교육이라면 최소한 교복과 학용품, 그리고 급식 정도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쿠바라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한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교사 한 명이 32.2명을 가르친다. 쿠바에서는 12명을 가르친다.
한국의 중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이 21.9명을 가르친다. 쿠바의 중학교에서는 10명을 가르친다. 또 하나. 쿠바에는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2000개가 넘는다. 한국의 농촌에는 폐교가 널려가고 있지만 쿠바에서는 가르칠 학생이 있는 한, 산꼭대기에도 학교를 짓고 교사를 보낸다."
결코 미국의 의사들에 뒤떨어지지 않는 쿠바의 의료 분야도 단연 돋보인다. 부럽게도 모든 쿠바인은 10~20가정마다 할당돼 있는 주치의를 갖는다. 이 주치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을 함께 하면서 '병에 안 걸리게 하는 일'에 주력한다. 항암, 에이즈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의약품을 개발하는 '쿠바의 힘'은 내로라하는 다국적 기업의 간담을 써늘하게 한다.
누가 그랬던가? 암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암으로 고통 받는 사람보다 많은 현실에서는 절대 암은 근절되지 않는다고? 쿠바에서는 그 반대도 충분히 실현 가능함을 보여준다.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공공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은 말 그대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그대로 실현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부디 당신들의 세계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쿠바는 지금 위기에 직면했다. 1990년대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도입했던 이중경제는 조금씩 사회주의 쿠바를 좀먹고 있다. '혁명'까지 상품으로 만드는 소비 욕망은 사회주의 쿠바인들의 마음을 서서히 장악해가고 있다. 쿠바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하다.
"달러 상점은 상품 소비적 탐욕을 부추겼고, 자영업은 자본가는 아니어도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등장시켰다. 식량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에서 시작된 암시장은 이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거리의 그늘 한 구석을 차지했다. 평범한 아바나 시민의 한 주일 급여에 해당하는 로레알 머리 염색약을 올려보는 젊은 여자의 시선이 비수처럼 번뜩인다."
쿠바 역시 우리가 찾아 헤매던 '푸른 유니콘'은 아니었던 것일까? "승리할 때까지(Hasta La victoria Siempre)." 체 게바라는 이 한 마디를 남기면서 볼리비아로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유재현은 아바나를 떠나면서 쿠바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부디 당신들의 세계를 지켜주세요." '느린 희망'을 지키는 쿠바인들에게 연대를….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