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육아일기이기 이전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사람의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다. 가까운 사람을 잃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새로운 사람을 탄생시키고, 사람으로서 세상을 보며 사람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 담담함이 무척 매력적이다." 정보라(<저주토끼> 작가)
<시사IN>에서 16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임지영 작가가 육아 일기 형식의 에세이집 <멍게의 맛>(후마니타스, 부제 '두 딸을 키우며 생각한 것들')을 출간했다. 2010년대 저자가 '평범한 직장 여성'으로서 겪은 11년간의 일들을 육아 일기 형식을 빌려 쓴 자전적 에세이집이다.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또 아이를 키우던 도중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고 있는 '젊은 암환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로서 이 사회에서 부딪히며 경험해 온 것들을 솔직하고 담담한 문체 속에 담아냈다.
기자로서, 인터뷰어로서 명성을 쌓아온 임 작가는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아동학대 사건, 최근의 탄핵 집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들을 취재하며 엄마로서 갖게 되는 복잡한 심경과 내밀한 감정들을 솔직히 고백하는 한편, 오늘날 '일하는 여자'가 넘어야 할 갖가지 장애물들을 특유의 낙천적 시선으로 위트 있게 그려낸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들을 두 아이와 함께 마주하며 때론 설명에 실패하고, 때론 아이를 통해 깨우치는 과정은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 어떤 동료 시민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한다. 무엇보다 1980년대생 '지영'과 2010년대생 두 아이의 10년에 걸친 성장사를 통해, '기자'와 '여성', '엄마'의 정체성을 가진 개인과, 또 각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독자로 하여금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만든다.
일과 육아 사이에서 분열하며 나 자신을 붙들고자 했던 여성이 "수시로 선을 넘는 생명체와 지지고 볶으며" '타인의 악의 없는 침범'에 너그러워지고 엄마의 자리의 나를 긍정하게 되기까지의 촘촘한 고민과 사유가 눈물겹다.
이 책의 기반이 된 일기의 최초 의도는 아이들의 빛나는 순간들을 기록해 두려는 것이었으나, 어느덧 육퇴 후 "화를 삭이기 위해" 쓰는 고발장이자 치부책이 됐다고 한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11년이라는 세월을 담게 된 지금, 한 여자가 이 험난한 반여성적 사회를 헤쳐 나가며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회고록이 됐다.
임 작가는 "자격 미달" 엄마의 이 일기가 "어느 한 시절이 영원할 것 같아 허둥거리는 부모들에게", "해질녘 아이를 옆에 두고 안도와 쓸쓸함을 동시에 느낄 한 여성"에게, 또 "다양한 형태의 가족 안팎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누군가의 아이였던 어른들"에게 가닿기를 상상한다.
또한 '두렵고 경이로운' 존재인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며 그려낸 사색의 경로를 탐색하는 것도 즐거움이다.
책 속에서
(106) 무채색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뻘겋고 샛노란 비비드 컬러가 내 하루하루를 물들이고 있다. 평소 느껴 보지 못한 감정의 세계로 나를 몰아넣는 저 작은 것. 세상 끝까지 화가 치밀다가도 끝내 다정한 화해로 마무리하는 일을 기꺼이 반복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
(234) 나는 왜 아이를 가졌을까? … 어쩌면 살아 볼 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어제의 확신이 오늘은 명백하게 깨지고, 당장 죽을 것 같다가도 금세 살 만해지고, 며칠 새 달라진 나뭇잎의 색깔로 세월의 흐름을 감각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밥알을 삼키는 동안 틈틈이 스미는 고달픔을 수용하는 하루, 그걸 겪게 하는 게 미안한 일만은 아니지 않을까? 나는 세상을 비관하는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도 않았다.
(319) 이동식 침대에서 수술대로 옮겨지는 동안 의료진끼리 주고받는 사담이 들려왔다.
"나 패드가 필요한데 사물함을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고요."
"그거 다른 방에서 본 것 같은데. 저쪽 방 캐비닛에서."
"내가 헷갈렸나? 어느 방인데요?"
일상적인 대화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나에겐 생이 걸렸지만 이들에게는 흔한 일상이다. 오늘 아침 해낸 양치질처럼 익숙하게 마쳐 주겠지 하는 생각에 어쩐지 안심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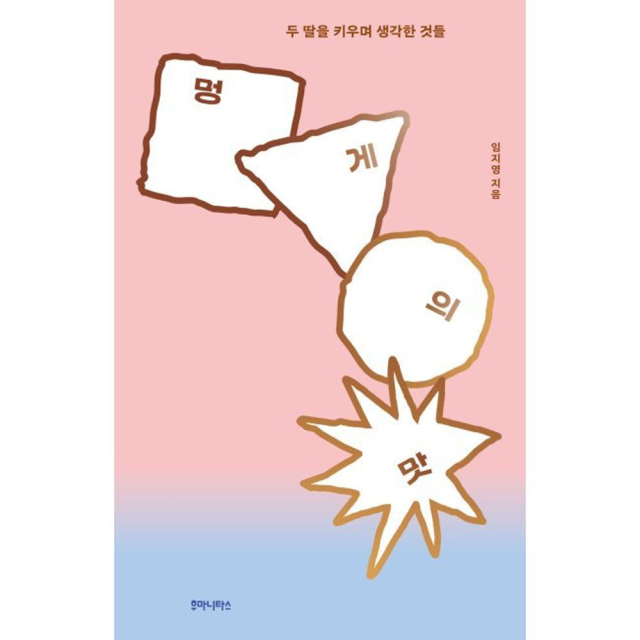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