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토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론조사 등 국회가 총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 시한을 "올 상반기 중" 즉 다음달 말까지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22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한 축사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 협상의 시간"이라며 "내년 총선에 우리 헌법정신과 취지가 부합되도록 하려면 올 상반기 중에는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쇠도 달궈졌을 때 두드리라는 말이 있다"며 "6월말 전에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서 안(案)이 마련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과 관련 "여야 협상을 하는 데에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중요한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앞서서도 몇 차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장은 공론조사 결과, 숙의토론을 거치기 전과 후에 각각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 →70%로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깊이 있게 공부하면 할수록 비례대표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토론을 맡은 전문가와 국회의원들도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에는 의견이 모였다.
토론회 발제자인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비례대표제 의석 증가는 대표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의 47석을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을 악화하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의석 확대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으로 고정하고 비례의석 47석에 30석을 추가해, 기존 47석은 6개 권역별로 인구수 비례 배분하고, 추가되는 30석은 비수도권 권역에 인구비례에 따라 추가 배분"하는 방안, 즉 전체 의석을 33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지역구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전면 소선거구제나, 대표성을 강조하는 전면 비례대표제보다 책임성과 대표성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혼합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이번 공론조사의 결론으로 들며 "유권자들은 소선거구제에 익숙해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고 선거구 크기가 커지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다만 김 의장이 언급한 도농복합형 제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3명 이상 선출 선거구에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사용되는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이양식은 중선거구제이면서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라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토론에서 "소선거구 56%, 중대선거구 44%라는 (공론조사) 결과를 놓고 '민심이 소선거구로 기울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를 혼합하는 혼합제가 국민 공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혼합제로 가되 지금보다 비례성을 높인 혼합제로 가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면서 "소선거구를 채택하려면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중복출마제, 석패율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권역비례형 혼합제(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의 경우 축소되는 소선거구를 대체하기 위해 권역 비례를 개방형으로 선출해야 하고, 도농복합형의 경우 특별·광역시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비례식 대선거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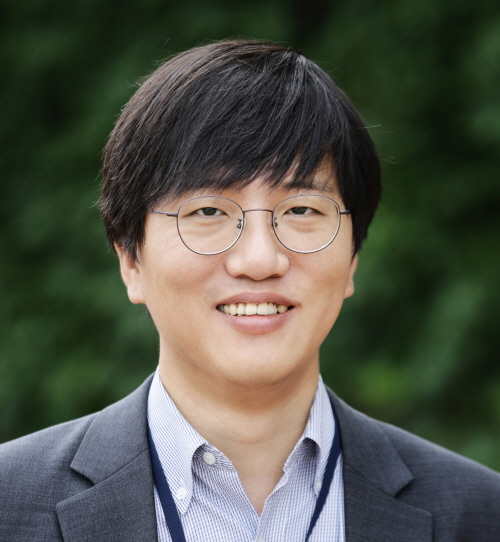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