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트 홀이 세상을 떠났다. 그를 거의 잊고 지냈던 나로서는 착잡하고 또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드는 일이었다. 마침 두어해 남짓 전 쓴 어느 글에서 그에 관한 험구를 늘어놓은 일이 생각나 자책감마저 들었다. 문화연구는 실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쾌락의 경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으려는 누군가의 생각을 비난하는 자리였다. 그는 이미 전 세계에서 문화연구의 교과서와 다름없는 역할을 하는 책의 저자였다. 나는 그와 그 주변의 학자들의 그런 맹랑한 발상은, 따지고 보면 스튜어트 홀이 먼 옛날 멀리 문화연구를 창립할 즈음부터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고 푸념을 늘어놓았었다. 그렇게 가끔 이름을 들먹이며 그를 상기하던 중에, 나는 갑작스레 그의 부음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심정 가까이에 그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 때 문화연구에 입문한 나와 같은 세대들에게는 눈부신 별이었다. 우리는 그의 글들을 읽으며 문화연구에 입문하였다. 마땅한 길잡이가 없던 그 즈음, 우리는 무작정 소문에 의지한 채 그의 글을 읽었다. 그는 특별히 대단한 역저를 쓴 적은 없다. 연구원으로 시작해 곧 소장으로 진두지휘했던 전설의 영국 버밍엄 현대문화연구소, 우리가 줄여 "CCCS(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라고 불렀던 그 곳에 그는 몸담고 있었다. 거기에서 그가 참여하고 편집해 출판했던 책들, 이를테면 <의례를 통한 저항>(Resistance Through Rituals, 1977)이니 <문화, 미디어, 언어>(Culture, Media, Language, 1980) 같은 것을 읽으며 우리는 청소년, 계급, 저항, 상징, 의미, 이데올로기 등을 잇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쓴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Cultural Studies: two paradigms)'이니 '기호화와 기호해독(Encoding / Decoding)' 같은 논문을 읽으며 아둔하고 갑갑했던 비판이론의 구속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찾으려 했다. 문화는 너무 흔한 것이었지만 또한 우리의 이론 속에서는 너무나 희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문화가 모든 것으로 난 창(窓)처럼 보이는 때였다.

1990년대는 우리에게 시간을 응시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역사적인 시간과 대면하는 방식을 바꾸어놓았음에 틀림없다. 1990년대 역시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역사의 어떤 시점에는 세계의 편에서보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감각과 의식의 편에서 더 많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는 새로운 감각과 의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문턱이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공통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4.19 세대 혹은 6.3 세대, 광주항쟁 세대, 민주화 운동 세대 같은 세대명과 서태지 세대, 다마고치 세대, 나이키 세대, 삐삐 세대 같은 세대명이 같은 방식으로 세대를 묶는 것일 리 만무하다. 그러나 그 차이는 기억의 소재가 하나는 정치이고 하나는 문화적 사태란 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이는 그다지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의 일차적인 특징은 총체성에 있을 것이다. 모두가 함께 자신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생애를 살아갈 때, 자신이 속한 풍부하고 다양한 삶의 시간 속에 살아갈 때, 그에 결부된 시간은 무한히 다양하다. 그렇지만 정치는 그런 시간을 총체화하는 힘을 발휘한다. 그 사건, 현장에 스스로 입회하였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정치적 사태를 통해 단숨에 하나의 시간에 속하게 되고, 공통의 기억 속으로 침전될 시간과 마주한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정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다.

1990년대, 문화의 시대로 알려질 시대에 나와 주변의 벗들은 청년기를 보냈다. 마침 우리는 1980년대의 눈부신 터널에서 빠져나온 참이었다. 서태지가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고, 하루키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기형도를 읽거나 김소진의 소설을 읽고 술집에서 시비를 거는 일이 다반사였다.
너바나(Nirvana)니 스매싱 펌킨스(Smashing Pumpkins)니 하는 밴드들의 이름을 익히고, 홍대 클럽에서 휘둥그레 한 눈으로 펑크 밴드의 공연을 보기 시작했던 때도 그 즈음이었다. 대항문화니 하위문화니 하는 것이 노동 운동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였다. 거리에는 시위대보다는 록밴드가 있는 것이 더 그럴듯하게 생각되곤 했다. 트로트 아니면 그저 그렇고 그런 발라드 일색이던 한국 대중음악은 마치 거대한 지각변동을 맞은 듯 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리듬 앤 블루스와 록큰롤에서부터 비틀즈, 밥 딜런을 거쳐 뉴욕과 런던의 풋내기 록 밴드에 이르는 음악들을 섭렵하기 바빴다.
잇달아 창간된 영화잡지나 문화비평 저널들을 읽는 이들이 주변에 넘쳐났다. 낯선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이름 역시 잇달아 세상에 선을 보였다. 이제는 무엇이든 사고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저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무언가 체증이 풀린 듯한 기분이었다. 모든 것에 시비를 붙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문화연구는 바로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이끄는 길잡이였다. 그리고 그 선두에 스튜어트 홀이 있었다.

우리는 문화에서 정치를 발견할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체성과 차이, 구별과 지배, 상징과 언어를 통한 저항, 바보 같은 문화소비자가 아니라 똑똑하고 재기발랄한 수용자 같은 말들을 입버릇처럼 뇌였다. 대학원에 들어온 총명한 친구들은 빠순이들을 저항적 팬덤으로 독해하는 민속지적 페이퍼를 쓰며 졸업을 하고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게임에 미친 덕후들, 망가와 아니메에 목을 맨 마니아들, 음산한 고딕풍의 화장을 한 채 홍대를 배회하는 고스족(the goths)은 쿨하기만 하였다. 그들의 비밀을 전해주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한 새로운 문화정치의 진짜 주인공들처럼 보였다.
그러는 새에 우리는 문화의 정치에서 그 정치란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란 점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는 시간을 총체화함으로써 공통의 세계에 대면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반대의 방향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문화의 정치는 바로 그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 우리는 해방의 정치를 조직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의 시간을 편성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아니 연대 책임을 질 일인 것처럼 말하지는 말자. 적어도, 나는 그 점을 깨우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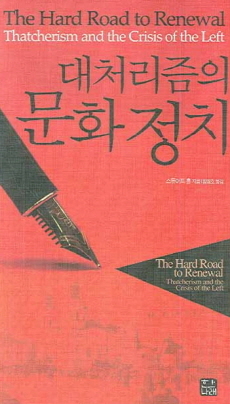
세계를 바꾼다는 것은 어쨌거나 공동의 세계라는 대상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탓에 홀 역시 동일한 시간의 감각 속에서 세계와 대면하게 하려 개입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안간힘을 다해 대처리즘이란 이름으로 문화를 경유해 공통의 시간을 구상하려 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른 지금 그의 분투가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가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외려 홀의 궤적과 그의 영향은 분석 자체에 달려있다기보다는 바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세계와 대면하는 우리의 습관, 그 가운데서도 사고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그 효력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작별을 고하는 것은, 그가 고집한 삶의 자세를 되새기는 일일 것이다.
그가 그토록 좋아했다는 마일즈 데이비스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나는 홀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와 마일즈 데이비스가 어쩐지 불협화음처럼 생각되더라도 말이다.

약사
1932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태어나 51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 영문학을 전공했다. 1960년 E. P. 톰슨 등과 함께 <뉴 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를 창간해 초대 편집장을 맡았고, 마르크스주의의 교조주의적 흐름에 반기를 든 신좌파의 시대를 이끌었다. 1964년 영국 최초의 문화연구소인 버밍엄 대학 현대문화연구소에 합류, 68년부터 79년까지 소장으로 재직했다. 알튀세르의 구조주의 이론을 대중문화와 결합해 풀어낸 '문화연구'는 홀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독자적 학문 분야로 대두되었고, 텔레비전, 광고 등은 사회의 권력 관계와 이데올로기를 읽어내는 텍스트로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홀은 1979년 마거릿 대처 총리 취임 몇 달 전 그녀가 영국 사회에 갖는 의미와 현상을 '대처리즘'이라 명명하고 깊게 분석하기도 했다. 그해 오픈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취임, 1997년 은퇴할 때까지 몸담았다. 2014년 2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2세.
스튜어트 홀의 글이 실려 있는 국내 번역서들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임영호 엮음, 한나래 펴냄, 1996)
<대처리즘의 문화정치>(임영호 옮김, 한나래 펴냄, 2007)
원서 The Hard to Road to Renewal: Thatcherism and the Crisis of the Left (1988)
<모더니티의 미래>(데이비드 헬드 외(공저), 김수진·전효관 옮김, 현실문화연구 펴냄, 2000)
원서 Modernity and Its Futures (1992)
<현대성과 현대문화>(데이비드 헬드 외(공저), 전효관 옮김, 현실문화연구 펴냄, 2001)
원서 Formations of modernity (1992)
그 외 주저
1972 with P. Walton. Situating Marx: Evaluations and Departures. London: Human Context Books.
1977 with T. Jefferson.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s in Post-War Britain. London: Hutchinson.
1978 with C. Critcher, T. Jefferson, J. Clarke, B. Roberts.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and Order. London: Macmillan. London: Macmillan Press.
1980 with D. Hobson, A. Lowe, and P. Willis.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1972–79. London: Routledge
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