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근·현대사 영역을 국정 교과서에 담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집권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유신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광복절'인지 '건국절'인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게 작금의 한국 현실이다. 근·현대의 음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작금의 정치·사회 현실에서 국가가 근·현대사를 일괄 평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검정 체제를 유지한다. 각자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근·현대사를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시장 원리에 맡긴다. 어느 시각 어느 서술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시장의 판단에 맡기고 자율 채택하도록 한다. 이런 취지에는 시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경쟁을 통해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다수가 인정하는 이 대전제에 견줘보면 안다.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정당한지를 비교하면 안다. 전혀 아니라는 걸 쉬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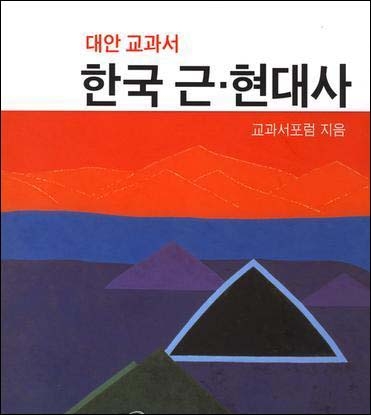
|
아, 표현이 잘못 됐다. 정부와 여당이 손보려는 근·현대사 교과서는 '일반'이 아니라 '특정'이다. 금성출판사의 그것을 집중적으로 손보려고 한다. 근·현대사 교과서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다는 금성출판사의 그것만 압박하려 한다.
이건 명백한 시장 개입이다. 민간 출판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이고, 학교의 자율적인 학사운영에 정부가 관여하려는 것이다.
맞지도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라는 자유주의 시장원리에 배치되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인 학교 자율화에 역행한다.
정부가 특정 제품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다. 그 제품이 독과점의 횡포를 부리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다.
하지만 근·현대사 교과서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교과서 시장엔 독과점 규정이 없다. 하자 기준 또한 없다. 교과서가 라면이 아닌 한, 자동차가 아닌 한 하자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 그건 시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조정되고 교정돼야 할 것이지 행정 권력이 나서 단죄할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정당성이라도 확보하려면 차라리 일본의 경우를 따르는 게 낫다. 극우단체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처럼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쏙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 경쟁에 나서는 게 순리다. 정부와 여당이 직접 나서면 공정경쟁원리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처럼 '외곽'을 동원해 교과서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
정부와 여당이 근·현대사에 확고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 저어할 이유가 없다. 진리는 언젠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게 역사의 금언이니 이를 따르면 된다. 자유주의 시장원리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하니 이를 구현하면 된다. 경쟁에 맡겨 '양화'로서 '악화'를 구축하면 된다.
아, 깜빡할 뻔 했다. '악화'를 구축하려면 '악화'가 시장을 잠식한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문제의 교과서로 꼽는 금성출판사의 시장 점유율은 52%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악화'가 시장을 넓게 지배하게 된 걸까?
도통 알 길이 없다. <동아일보>가 지난 18일 공개한 교원단체별 교사 수를 보면 더더욱 혼란스럽다. 18.3%라고 했다. 전체 교원 가운데 전교조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8.3%라고 했다.
간극이 너무 크다. '좌편향 교과서' 점유율 52%와 '좌편향 전교조' 비율 18%는 아무리 봐도 궁합이 맞지 않는다. 혹시 고교 교원으로 한정할 경우 전교조 회원 비중이 50%를 상회하는가 싶어 꼼꼼히 살폈더니 이 또한 아니다. 분포는 비슷했다.
이유가 뭘까? 좌편향에 빠지지도 않은 학교가, 교사가, 학교운영위가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한 이유가 뭘까?
정부와 여당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이 숙제부터 풀어야 한다.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