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과 28일 대만(타이완)의 운림과학기술대학교에서 영국 정부의 '예술과 인문 연구위원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HRC)'와 대만의 재정 지원으로 열린 심포지엄과 워크숍 <전 세계를 위한 동아시아 디자인 역사의 서술과 번역(Translating and Writing Design Histories in East Asia for the Global World)>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며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예 및 디자인 분야의 전공자 약 20명이 참여한 행사였다.
서세동점의 세계사적 대세를 배경으로 전개된 서양 개념의 수입이나 번역, 민족적 정체성, 초국가적 전개(transnational development)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심포지엄은 근·현대 동아시아의 공예와 디자인 분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그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논의하였다.

|
| ⓒ김용철 |
관련 이슈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의 근·현대 공예 및 디자인 분야의 개념 문제나 민족 정체성, 지역 정체성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동아시아 공예 및 디자인에서 공통되는 주제인 한자어 번역이나 개념의 문제는 문제의식의 공유 차원에서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컸다.
전근대에는 수공예의 하나였지만 근대에 들어 미술의 한 장르가 된 도자기나 목공예 등을 아우르는 '공예(工藝)'라는 개념, 그리고 서양에 뿌리를 둔 그래픽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 패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파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디자인' 개념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근대 동아시아의 교류와 초국가적 전개, 제국주의, 식민지의 지역 정체성, 전후 아메리카니즘과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문제 등이 도자기나 포스터, 패션, 전자 제품 등을 통해 다루어짐으로써 논의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졌다.
원래 이 행사는 동아시아와 영어권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자임한 동아시아 출신 영국 거주 연구자 모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모임의 취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근·현대 동아시아의 공예 및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과를 영어로 번역하고 비평하는 것이었다.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각 국민 국가별 혹은 언어권별로 분절적인 상황을 넘어서지 못한 채 진행되어 온 논의의 내용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확인하고 비교하는 장으로 발전하였다. 행사를 기획한 동아시아 출신 영국 거주 연구자들과 동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논의 내용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준 점도 중요한 의의 가운데 하나다.
영어로 진행된 발표나 질의 및 답변, 워크숍에서 각 연구자의 주제는 근·현대 동아시아의 공예 및 디자인 분야의 시각 이미지를 다루면서도 제국주의나 민족주의, 오리엔탈리즘,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함께 아시아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등 다양한 층위를 내포한 것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가별 연구자 사이의 미묘한 긴장 관계도 드러났다. 그와 같은 긴장 관계는 원래 근대 동아시아 디자인의 실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0년대 이후 오리엔탈리즘이나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풍미와 함께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이 자리 잡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이나믹한 논의의 전개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로서도 의미가 있었다.
오랜 역사의 굴곡을 통해 형성된 대만의 지역 정체성과 식민지성 추출의 곤란함이나 공예 및 디자인에 반영된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대한 시기별 구분의 필요성 등에 관한 충실한 논의가 가능했던 것도 이번 행사의 의미 있는 성과였다.
세계 각 지역에 산재한 중화권 연구자들이 보여준 장대한 스케일과 시야 또한 행사의 흥미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중국 대륙에서 이들 분야의 연구가 뒤쳐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활동과 그들 사이의 네트워킹은 동아시아 공예 및 디자인을 읽는 데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또한 그것은 향후 근·현대 중화권 디자인을 역사화하는 단계에서 제기될 헤게모니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그에 비하면 자국에 대해 'another China', 'better China'로 규정하는 대만 연구자들의 자부심과 열의는 또 다른 주목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개최지의 과도한 자기 어필이 아니었다. 1945년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과 중화민국 역사가 시작된 대만은 1950년대 말부터 디자인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가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설정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독일이나 일본에서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디자인의 부흥을 도모한 바 있다.
1970년대 이후 디자인 분야의 슬로건이기도 하였던 'MIT(Made in Taiwan)'를 통하여 일본의 제품과 경쟁하였지만, 지금은 중국 대륙을 의식하며 중화권 내에서도 특수한 위치에 있는 자국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타 지역과 소통에 적극적인 대만의 현주소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대만이 한국과도 '느슨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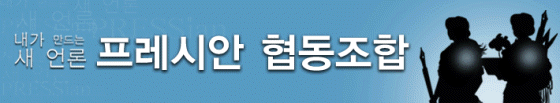
|
근·현대 동아시아의 공예나 디자인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는 일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개별 국가 단위에서도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이해나 그것이 남긴 유산이 아직 말끔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다. 따라서 공예나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어 통합에 이르는 길은 멀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제들로 인하여 얼마간의 긴장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임은 자명하다. 방법론적 성찰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라는 통합적 시각에서 권역 내의 공예나 디자인을 살피는 일은 일국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시작함으로써 각 분야의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동아시아인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축은 이들 공예 디자인 분야로 지탱된다. 그 영역을 시각 문화로 확장시켜 문화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 지역에서 영위되었거나 영위되고 있는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전 세계를 위한 동아시아 디자인 역사의 서술과 번역>은 바로 그 점을 환기시킨 행사였다.
| <프레시안>은 동아시아를 깊고 넓게 보는 시각으로 유명한 서남재단의 <서남포럼 뉴스레터>에 실린 칼럼 등을 매주 두 차례 동시 게재합니다. 김용철 전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의 이 글은 <서남포럼 뉴스레터> 192호에 실린 글입니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