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인을 하면 적어도 50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 중 25개만 미리 생각해내도 천재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당신은 천재도 아니다."
완전 범죄가 가능한 것인지 묻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완연한 평안도 사투리로 대답하는 노(老) 법의학자 문국진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건 불가능하디.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어떤 범죄든. 프랑스 법의학자 에드몽 로카르가 남긴 유명한 법칙이 있잖소.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그러니까 기기 그런 거요. 완전 범죄는 없다, 이게 내 생각이디."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일선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범죄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 도저히 더 이상 수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어서 미궁에 빠질 때가 있다. 바닷가 지방에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해안가로 둥둥 떠오는 이민 가방 1개가 어민들에게 발견됐다.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본 사람들은 질겁한다.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거의 진흙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시체가 한 구 들어있었던 것이다.
스스로 가방 안에 들어가서 지퍼를 잠그고 바다로 몸을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뿐. 더 이상 수사를 할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살해 당시 남겨졌을 흔적은 이미 바닷물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부검을 해봐도 이미 칼을 댈 필요도 없이 뼈에 붙어있는 근육과 피부가 밀려 떨어지는 형편이니 사인(死因)을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웠다. 피해자의 신원이라도 알면 탐문이 가능할 텐데 손가락뼈에서 지문을 채취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남아 있는 의복으로 볼 때 피해자는 젊은 여자로 보였다. 그나마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해골만 남은 머리에 씌워진 가발이었다. 젊은 여자가 가발을 썼으니 아마도 미용 가발일 텐데 당시만 해도 여염집 여성이 미용 가발을 쓰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술집 혹은 다방에서 일하던 사람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건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개 출신 지역과 다른 곳에서 일을 한다. 가출하거나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는 경우도 많아서 어느 날 사라져도 실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 당시 경찰이 자랑하던 슈퍼임포즈(superimpose) 기법은 두개골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 비교가 가능할 뿐 해골만 놓고 원래 얼굴을 복원할 수는 없었다. 담당 형사가 TV의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하는 등 갖은 애를 썼지만, 결국 피해자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 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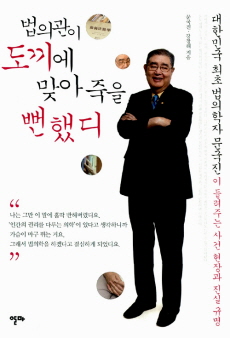
|
| ▲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죽을 뻔했디>(문국진·강창래 지음, 알마 펴냄). ⓒ알마 |
"사람에게 생명도 중요하지만, 권리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이 임상의학이라면, 사람의 권리를 다루는 의학은 법의학이다. 법의학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발달된 민주 국가에서만 발달한다. 따라서 법의학의 발달 정도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나 민주화 정도를 알 수 있다."
이 몇 줄의 문장이 문국진으로 하여금 법의학도의 길을 걷게 했고 우리나라에 법의학이 존재하게 했다. 문국진 전에는 이 땅에 법의학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작은 자못 진지하고 무겁지만 이 책에는 흥미진진한 사건 얘기가 가득하다. 법의학 책에는 물론 특이한 사건, 수사관의 능력을 시험하는 대담한 범죄자의 얘기가 등장하게 마련이지만 1955년 이래 60년 이상 한 길을 걸어온 우리나라 법의학의 산증인이 하는 얘기인 만큼 당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이 쉴 틈 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책의 미덕은 단순히 재미있는 사건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의학자들이 쓴 책에는 특이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내려지지만, 한참 읽다 보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다르게 생각해볼 수는 없었던 것이지, 저자가 자신 있게 내세우는 결론이 과연 사건의 진상이 맞는지 궁금해진다. 물론 직접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독자를 대신해서 법의학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인터뷰어 강창래가 있다. 단순히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문이 아니다. 책 말미에 붙어있는 120권이 넘는 참고 서적이 웅변하듯이 거의 전문가 수준에 달한 강창래의 질문은 일방적인 설명만으로는 기대하기 힘들었을 만족감을 준다.
책의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법의학자는 실제 사건의 분석을 넘어 예술가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 미술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스터리를 추출해서 법의학적 해석을 가한다.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과연 살리에리인지, 고흐의 자살에 사용된 권총을 가져다 놓은 것은 정말 고갱인지, 미처 모르던 다양한 가설들과 근거를 나열한 후에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 직접적인 사인을 설명하는 것(예를 들어 고흐의 복부에 들어간 총알은 좌측 횡행결장 또는 하행결장의 상부 손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장 내용물이 복강에 유출되어 일어난 급성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했다고 분석한다)을 들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개인적으로는 법과 대학을 다니던 시절 법의학 시험을 보면서, "한강에서 남자의 시체가 떠올랐는데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 사인은 무엇으로 보이는가"라는 문제에 "소변을 보다가 실족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답변 이외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추리력과 상상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뼈저리게 반성이 된다.)
다시 완전 범죄의 문제로 돌아와서, 과연 저자의 주장처럼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고 따라서 완벽히 법망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책을 다 읽고 난 지금에도 그 생각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 중 적어도 일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세상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채 묻히고 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생을 법의학 연구에 바치고 말년에는 역사 속에 감춰진 범죄까지 파헤쳐보려는 노력을 하는 노대가(老大家)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는 않는다. '사람의 권리를 다루는 의학'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결국 일가를 이룬 저자의 언급은 어쩌면 평생을 걸려서 대적해온 범죄에 대해 던지는 호기로운 경고일지도 모른다. 망설임 없이 한길을 걸어온 '진짜 전문가'의 시각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