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식인들이 종종 자기 분야를 넘어서는 '일탈'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되새겨 보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게다가 인문학자들이 쓴 소설이란 대개 지루하지 않던가. 하지만 처음의 놀라움을 뒤로 하고 원고를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소설이 다루는 시대와 그 이야기가 전혀 새로웠던 것이다. (그래도 초반 전개가 소설로서는 약간 지루한 편이어서 '인문학자의 소설'이라는 생각이 전혀 틀린 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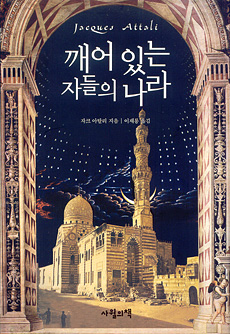
|
| ▲ <깨어 있는 자들의 나라>(자크 아탈리 지음, 이재룡 옮김, 사월의책 펴냄). ⓒ사월의책 |
스페인 남부의 중심 도시 코르도바에서 시작하여 톨레도를 거쳐 프랑스의 나르본으로, 북아프리카의 세우타와 마라케시 그리고 페스로 향하는 여정은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흥분된다. 마치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 중세 수도원의 풍경을 생생히 그려낸 것만으로도 흥미를 자아내듯이 말이다. 하지만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이 그렇듯이 자크 아탈리의 소설 역시 풍경 뒤에 숨겨진 이야기야말로 진짜배기다.
주인공인 두 사람은 이슬람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아베로에스(이븐 루시드)와 유대의 현인 마이모니데스(모세 벤 마이문)이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과 유럽의 중세 철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철학자들이다. 하지만 둘 모두 철학사에서 흔히 잊히거나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중세의 기독교 전통에서 이들은 이슬람과 유대교라는 낯선 배경을 가진 철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크 아탈리는 이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발굴하여 유럽의 역사를 바꾼 르네상스의 기반을 일구었는지를 역사적 상상력으로 복원해낸다.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비밀의 책'을 찾아나서는 팩션적 요소를 도입하고 그 여정 가운데 벌어지는 살인 사건을 추리 기법으로 구성하여 소설적 재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중세 스페인의 '정신적 풍경화'를 그려냈다는 점이다. 당시 알모아데족이라는 이슬람 광신자들이 지배했던 스페인은 오랜 공존의 시대가 깨어지고 서로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박해하던 때였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상들을 질식시키며 분서갱유(焚書坑儒)를 서슴지 않았다. 오늘날 이스라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분쟁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질식할 듯 정신적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두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통해 정신의 유토피아를 꿈꾼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찾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현자들과 조우하며 중세 스페인에 있었을 법한 다채로운 생각들과 마주친다. 이러한 마주침을 통해 아베로에스와 마이모니데스는 종교와 종교, 종교와 이성을 가르는 마음의 편견을 깨부순다.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과학이 겉으로는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결국 '진리'라는 같은 길을 가는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깨어 있는 자들의 나라>는 새롭고도 위험한 사유를 펼쳐내는 두 철학자를 조명하며 낡았기 때문에 오히려 낯설어진 과거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 한국과 중세 스페인은 얼마나 다른가. 이곳 역시 종교적 근본주의 혹은 이념적 광신이 인간의 이성을 압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역시 다른 생각을 거부한 채 종교나 이성 가운데 하나만을 택하고 있지 않은가.
'신앙과 이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를 묻는 <깨어 있는 자들의 나라>는 오래된 질문이 가장 새로운 질문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인간에 대한 질문 역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고민을 안고 방황한다는 점에서 두 철학자의 여정과 우리의 길은 정확히 겹친다.
"나쁜 소설만이 자전적이네. 좋은 소설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쓰이지. 그리고 그 본성이란 허구 속에서만 찾을 수 있고." (347쪽)
정치와 경제, 문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자크 아탈리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이 소설은 타자를 환대하고 신앙과 이성이 서로를 밀쳐내지 않고 조화되는, 아무도 가지 않은 '정신의 영토'를 개척한다. 지적 모험과 철학적 대화가 함께하는 이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기란 쉽지 않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