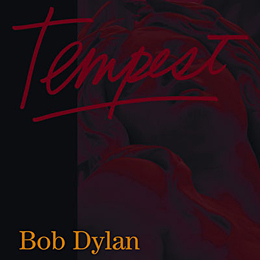
|
| ▲밥 딜런 [템페스트]. 프로듀싱은 역시나 잭 프로스트가 맡았다. ⓒ소니뮤직 |
앨범 재킷 사진은 오스트리아 의회 앞에 세워진 조각상의 일부를 찍은 작품이다. 이 조각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나 여신을 본떴다. 비극의 날에, 전쟁의 여신의 모습을 커버로 채택했고, 타이틀명은 '폭풍'이다. 심지어 앨범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희곡의 그것과 같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밥 딜런은 신보를 셰익스피어의 그것에 빗대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걸 거부했지만, [템페스트]는 여러모로 전설로 남길 거부하는 이 노장이 여전히 특유의 냉소로 가득 차 있음을 상징하는 장치로 가득하다.
바이올린의 리드로 시작해 무려 13분55초 동안 처음의 곡 테마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Desolation Row>를 생각하면 된다) 이 타이틀트랙은 타이타닉호에 대한 만가(輓歌)다. 코러스 없이 45개 단락으로 나뉜 이 곡은 제임스 카메론의 동명 영화 내용에 기반했다. 타이타닉호가 출항한 후 침몰하기까지 일어난 일을 모조리 가사로 읊어냈다. <스핀>은 영국 시인의 해양 서사시 <늙은 선원의 노래>를 커버한 아이언 메이든(Iron Maiden)의 동명 트랙과 이 곡을 비교하며 밥 딜런의 곡이 완승했다고 평가했다.
사운드적으로 [템페스트]는 딜런이 21세기 들어 천착해 온 '과거로의 탐험', 즉 그가 젊은 시절을 함께 한 포크, 포크록 이전의 시대를 조명하는 시도가 전작들에 비해 더욱 두드러진다. 첫 싱글 <Duquesne Whistle>(듀케인 휘슬)은 일견 재지함마저 느낄 수 있는 곡으로, 딜런은 이 곡에서 시니컬한 태도로 <템페스트>와 마찬가지의 주제의식에 천착한다.
시카고 블루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Early Roman Kings>은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만드는 노래지만, 딜런은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난 네게서 인생을 빼앗을 수 있다. 네 숨을 거둘 수 있다. 너를 죽음의 집에 데려갈 수 있다"고 노래한다. 이 냉소적인 구절만 봐도 딜런이 <Like a Rolling Stone>(라이크 어 롤링 스톤)을 부를 당시나 일흔이 넘은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근래 딜런의 곡 중에서 가장 비트감이 강한 <Narrow Way>는 전설적인 델타 블루스 뮤지션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이 속했던 미시시피 셰익스(Mississippi Sheiks)의 <You'll Work Down to Me Someday>(유 윌 워크 다운 투 미 섬데이)의 코러스를 따왔다.
평단은 대체로 이 앨범이 "밥 딜런의 후기 작품 중 최고"라는 데 동의한다. <롤링 스톤>이 만점을 매긴 것을 비롯해, <아메리칸 송라이터>, <스핀>, <가디언>, <데일리 텔레그라프>, <USA 투데이> 등 유력매체 대부분이 [템페스트]를 [Modern Times](모던 타임즈)를 넘어서는 딜런 후기 최고의 작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밥 딜런의 가사쓰기를 평하기란 쉽지 않은데, 곡들에 사용된 다양한 은유와 각운 맞춤 등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문학을 전공한 이나, 현지 문학은 물론, 다양한 역사와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가 아니라면 밥 딜런에 해외 평단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실제 밥 딜런은 영미권에서 단순히 음악인을 넘어 문학의 거장으로 존중받고 있으며, 이는 [템페스트]가 나온 후 <데일리 텔레그라프>가 그를 마크 트웨인에 빗댄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일례로 <아메리칸 송라이터>는 타이틀트랙에 대해 "인류가 자각하지도 못한 채 불운을 향해 가는 데 대한 은유"라고 평하며 [템페스트]가 "딜런을 열렬히 기다려 온 팬들이 가장 바라마지 않던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한편으로 [템페스트]는 각계에서 밥 딜런의 앨범 중 가장 어둡고, 가장 시니컬한 유머로 가득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아예 <스핀>은 [템페스트]가 딜런 재기의 결정적 역할을 한 작품이자, 이전까지 가장 어두운 작품으로 평가받았던 "[Time Out of Mind](타임 아웃 오브 마인드) 이후 가사적으로 가장 까다롭고, 가장 정중하게 즐길만한 앨범"이며 "[타임 아웃...] 이후 그의 커리어에서 최고"라고 칭찬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곡이 <Tin Angel>(틴 엔젤)이다. 갱이 얽힌 삼각관계의 끝에 여성이 칼을 휘두르고, 총알이 몸을 관통하는 섬뜩한 결말로 끝나는 이 곡을 두고 <아메리칸 송라이터>는 "딜런추종자(Dylanologist)들이 찾던 상징과 숨은 뜻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평했다.
또 <스핀>은 <Scarlet Town>(스칼렛 타운)을 두고 "코맥 맥카시의 소설을 터덜터덜 걷는 곡"이라고 설명하며 [템페스트]가 "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코맥 맥카시는 우리나라에도 소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더 로드> 등으로 잘 알려진 현대 미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
마지막 곡이자 앨범에서 가장 평이하고 편안한 사운드의 곡인 <Roll on John>(롤 온 존)은 존 레논에 대한 밥 딜런의 헌사를 담은 곡으로, <Come Together>, <A Day in the Life> 등 존 레논이 쓴 곡의 가사에서 뼈대를 가져왔다. 존 레논이 (아마도) 쿼리멘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신시아와의 결혼과 파경,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roll'이란 단어를 부각시켜 압축적으로 마무리 지은 곡으로 추정된다. 편안한 소리에 비해 가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그의 삶을 설명한다.
반백년을 굳건히 버텨온 밥 딜런이 여전히 신곡으로만 채운 앨범을 냈고, 그 앨범의 날카로움이 예전보다 더하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의 이 예스러운 앨범이 빌보드차트를 호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대한 뮤지션에 대한 예우가 이뤄지기 힘든 한국의 척박한 토양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이 앨범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거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펫 숍 보이스 [엘리시움]
.JPG)
|
| ▲펫 숍 보이스 [엘리시움]. ⓒ워너뮤직 |
지난 6월 2년 만의 신보 [Americana](아메리카나)를 크레이지 호스(Crazy Horse)와 함께 발표한 닐 영(Neil Young)은 곧바로 다음 달 중 [Psychedelic Pill](사이키델릭 필)을 또 발표할 예정이다. 다이노서 주니어(Dinosaur Jr.)도 3년 만에 신보를 내고 월드투어를 예정했다. 어느새 잊혀진 이름인 노 다웃(No Doubt)은 11년 만에 복귀하며, 재결합해 팬들을 열광케 한 사운드가든(Soundgarden)은 무려 16년 만의 신보를 내놓을 준비를 마쳤다. 신스팝의 전설 펫 숍 보이스(Pet Shop Boys)도 이 행보에 합류했다.
앨범명을 떠올리게 하는 차분한 사운드가 가득한 신보 [Elysium](엘리시움)은 근래 불같이 일어나는 일렉트로니카 사운드의 격렬함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앨범 [Yes](예스)의 비트감과 활발한 기운도 찾기 어렵다. 여러모로 [Introspective](인트로스펙티브) 이후 이들이 마치 자신의 다른 얼굴인양 내놓은 작품이자, 신스팝 앨범의 최고봉에 우뚝 솟은 [Behaviour](비헤비어)를 연상케 할만한 작품이다. 실제 <가디언>은 [엘리시움]을 [비헤비어]와 비교하고 있다.
<인디펜던트>는 아예 "[엘리시움]이 약점을 갖고 있다면 '디스코 팝 괴물 트랙'이 없다는 점"이라면서도 "당신이 이를 받아들이고 크리스 로우(Chris Lowe)가 주조한 신스 텍스처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무릎을 꿇기만 한다면, 곧바로 닐 테넌트(Neil Tennant)의 작사능력이 최고조에 올랐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 신문은 [엘리시움]에 별 5개 만점 중 4개를 부여했다.
[엘리시움]은 [비헤비어] 이후 실로 오랜만에 이들의 따듯한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는 수작이라 할 만하다. 전형적인 '올림픽 송'인 <Winner>(위너, 이 곡은 런던 올림픽에 쓰였다), <A Face Like That>(어 페이스 라이크 댓) 정도를 제외하면 상승하는 기운을 가진 곡을 찾기가 어렵다.
대신 앨범을 감싼 이전과 다른 기운은 바로 첫 곡 <Leaving>(리빙)에서부터 느껴진다. 닐 테넌트의 저음이 이어지는데다, 흐릿한 코러스의 기운과 시종일관 차분한 진행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비헤비어]의 첫 곡이자 이들을 대표하는 곡 중 하나인 <Being Boring>(비잉 보어링)을 연상케 한다. 심지어 떠나는 연인을 쉽사리 보내지 못하는 미련, 곧 회한을 담은 노래라는 점마저 잃어버린 과거를 슬프게 추억하는 <Being Boring>의 가사 내용과 어느 정도 맞닿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기운은 <Invisible>에까지 이어진다.
가사쓰기에 대한 닐 테넌트의 자부심이 드러난 곡으로 "스토리나 은유를 전혀 담지 않고 일기를 쓰듯 가사를 쓰는 요즘 팝스타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는 <Ego Music>은 기계적인 차가움이 느껴지는 곡으로, [Nightlife](나이트라이프) 이후 이들의 사운드를 닮았다. 닐 테넌트의 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단어가 반복되는데, 레이디 가가(Lady Gaga)를 비판한 곡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앨범 후반부의 곡들은 보다 과거, 곧 80년대의 기운을 강하게 풍긴다. 특히 반복적인 코러스를 넘어 전면에 등장하는 건반 연주와 곧바로 이어지는 통속적 멜로디가 귀를 자극하는 <Give It a Go>는 전형적인 80년대 스타일의 신스팝으로, 특히 여전히 과거 댄스음악과의 접점이 큰 국내 팬들은 친숙하게 소화 가능한 곡이다. <Requiem in Denim and Leopardskin>(레퀴엠 인 데님 앤 레오파드스킨)은 도입부에서부터 곧바로 <West End Girls>(웨스트 엔드 걸즈)를 떠올리게 만든다. 펫 숍 보이스의 길을 열심히 따라온 올드 팬이라면 가슴 뭉클한 기분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예스]가 보다 크고, 현란한 기운을 담아 이들이 건재함을 알렸다면 [엘리시움]은 이들이 위대한 멜로디메이커이자 '팝의 장인'이었음을 웅변한다. 특히 앨범에서 힘을 받는 지점은 바로 멜로디다. (이들의 특성상 당연히 그렇겠지만) 최근 클럽 음악을 휩쓰는 전자음악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었던 멜로디의 위대함을 마음껏 맛볼 수 있으면서도, 기획된 주류 팝의 그것과는 애초에 특질이 다르게 지워질 수밖에 없는 이들의 멜로디 감각을 [엘리시움]은 제시한다. 만들어진 보컬과 달리 처음부터 라이브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닐 테넌트의 미성,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데 신경 쓰지 않고 뜨끈한 '기운'을 전달하는데 집중했던 이들의 멜로디가 빛을 발한 앨범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