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신문>(강응천 外 지음, 문사철 기획, 사계절 펴냄)은 <역사신문>(전6권·1997년 완간), <세계사신문>(전 3권·1999년 완간)에 이어 출판 기획 문사철(文史哲)이 펴낸 '신문으로 읽는 역사'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꼬박 3년간의 집필 과정에서 3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한 '대작'이다.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자부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는 이 책은 한국 사람이 지녀야 할 자부심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한다.
"분단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불안정하다. 남과 경쟁해서 조금 앞서게 됐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지도 잘 모르겠다.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 것은 한국인이 온갖 불행을 겪으면서도 역설적으로 제국주의, 분단, 빈곤, 독재 등 근현대 세계가 배설한 가장 고약한 범죄와 맞서 싸워 왔다는 사실이다.
독자들은 <근현대사신문>을 읽으면서 한국이 처한 문제들을 풀지 않고는 근현대 세계가 자신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자유롭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이 세계사의 초라한 단역이 아니라 늘 당당한 주역이었으며, 앞으로도 주역이어야 한다는 점도 깨달을 것이다."
신문으로 편집한 '격동의 한국사'
책은 신문의 형식을 빌려 당대의 사건과 사람들을 생생하게 조명한다. 총 2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1987년 개항부터 1945년 해방까지를 '근대편'으로 묶고, 촛불이 밝혀졌던 2003년까지를 '현대편'에 묶어 모두 40호를 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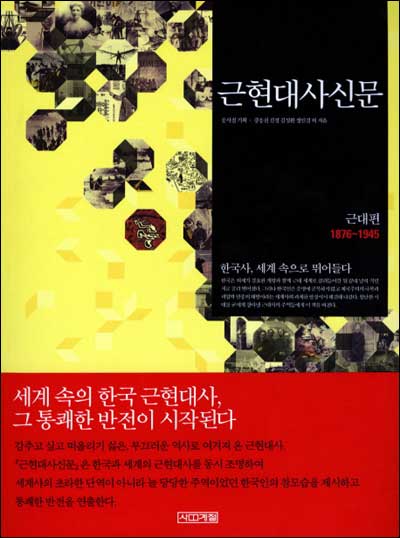
|
| ▲ <근현대사신문>(강은천 外 지음, 문사철 기획, 사계절 펴냄). ⓒ사계절 |
'점점 더 가까워지는 아시아·아프리카'. 서구 열강의 오랜 지배에 시달려온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1955년 반둥회의를 다룬 기사의 제목이다. 이 옆에 나란히 배치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남북한' 기사를 함께 볼 때, 역사는 '박제'가 아니라 생생한 격동의 현장으로 독자들을 불러온다.
4면은 사설·인터뷰·특별기고·만평 등을 담아 지은이들의 역사 의식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다. 5·6면은 사회·경제·과학·문화로 나눠 당대의 풍경과 사람들을 두루 소개했고, 8면에는 생활·단신 기사들을 실었다. 정치사 중심의 편향에서 벗어난 이 책의 미덕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8면에 고정적으로 배치한 '제3세계 통신'은 서구 강대국 중심의 역사 서술을 벗어던지고, '강자의 이야기'를 곧 '역사'로 바라보는 좁은 역사 의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광복,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일들은 호외로 다뤄 깊이를 더했다.
'죽어있는' 역사가 현실로…권력자를 떨게 할 '재밌는' 역사
저자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지만, 이른바 '자학 사관'을 바로잡겠다며 나선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 "제국주의의 논리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온 역사"를 강조하면서 민초의 시각으로 근현대사를 조명하고, 분단과 빈곤, 독재라는 '세계사적 범죄'에 대한 날선 비판도 빼놓지 않는다.
"대중이 역사를 알고 깨어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 두려운 자들은 역사를 재미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말처럼, '죽어있는' 역사를 이 시대로 불러와 오늘의 현실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는 남다르다. 다른 역사책에서는 몇 줄의 딱딱한 문장으로 만나는 사건들이 정작 그 시대에는 얼마나 뜨겁고 절절한 문제였는지, 큼직한 사진과 시원시원한 편집으로 역사는 '박제'가 아닌 '격동'으로 독자들을 찾아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