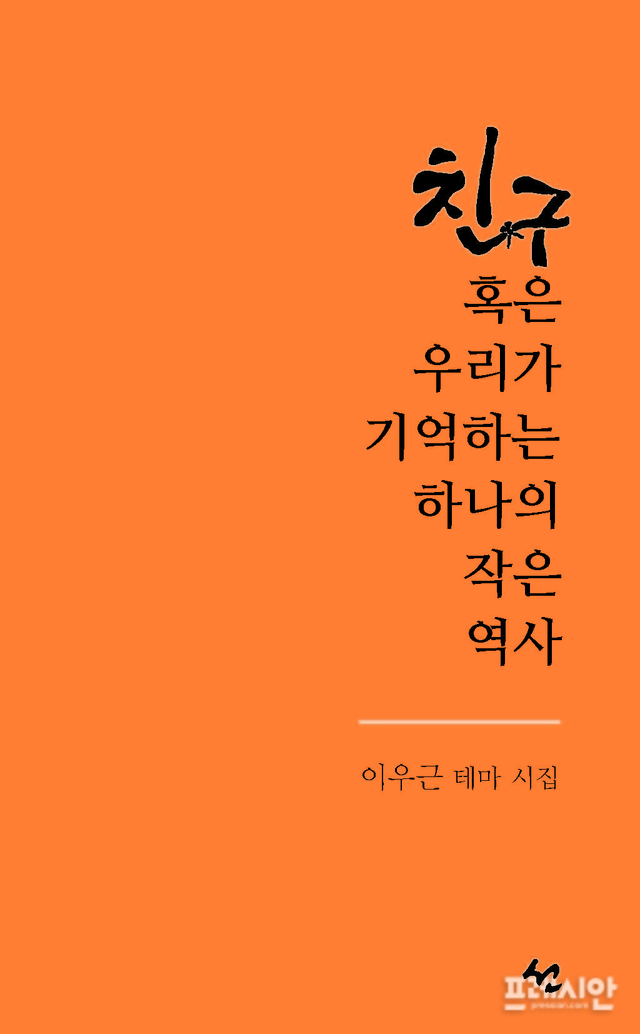
어느 모퉁이에 있어도, 어떤 힘들 일을 해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들이 하늘이고 나무고 꽃이고, 바람이며 물이며 햇빛이자 그늘이라는 소박한 형상들을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그런 사람들, 잘 알려지지도 않아 익명(匿名)의 섬으로 살아가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작은 주체라고 힘주어 말하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정리하면서, 민중과 대중의 객체적 실체로서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
오늘날 민중, 혹은 대중, 나아가 지민(知民)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일반적인 사람들은 몇 해 전의 촛불혁명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위상을 스스로 확인한 사람들이다. 개인의 역할이 소중함을 깨닫고 밀집하고 총합하면 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들을 공유하게 되었다. 비록 시위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각종 미디어나 개인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동조하며 역사를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인은 이런 점에서 비록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현실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역사는 몇몇 힘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이 땅에 별처럼 풀꽃처럼 잡초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연대의 힘과, 비록 생업에 매진하느라 전망이 없는 강박한 삶에서도 오직 나아가고자 하는 필생의 노력이 세상을 끌어가고 바꾸어가는 힘이라고 간곡하게 피력하고 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신작로에서 하늘의 길까지
선(線)으로 시작하여
마음의 지평(地平)을 넓히는 무한의 작업
유한(有限)에서 안타까워도
그것들을 부축해
먼 길 가는 거
사람들의 마을로 향하는
속보(速步)
혹은
둔보(鈍步).
-(길의, 모든 것에서의 시작-엄기영) 중 일부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