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기·청동기·철기라는 전통적 시대구분이 있다. 영국의 식물학자, 생체역학자, 통계학자인 롤랜드 에노스가 이런 통념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한다. '목재 중심적lignocentric시각'을 더하자는 것.
나무에서 살던 인류가 땅으로 내려왔을 때 초기 인류는 땅을 파는데 사용할 막대기를 만들어 새로운 식량원을 획득한다. 다음 단계로는 마른 목재가 불에 잘 탄다는 성질을 활용해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음식을 불에 익혀 먹는다. 이때 돌이 중요했을까 나무가 더 중요했을까 이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보자. 저자의 중간 결론.
"인류가 점차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들이 목재로 만든 도구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목재로 만든 무기 덕분이다."
따라가다보면 특별한 죽비 세례를 만난다.
유럽에서는 종이를 아마나 면화의 섬유를 이루는 길고 가는 세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제지산업은 넝마를 재활용해서 원자재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넝마 공급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사람들은 이를 대체할 소재를 찾기 시작했다. 일찍이 18세기 초 프랑스 과학자가 목재로 종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목재로 만든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변색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종이는 신문처럼 수명이 짧은 용도의 적합했고, 이는 조악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펄프 가격을 극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저널리즘에 혁명을 가져온다.
"목재펄프로 만든 값싼 종이가 파급효과를 불러온 분야는 신문만이 아니었다. 목재펄프를 지금처럼 책으로 만들기 적합한 종이로 바꾸어주는 두 가지 화학 처리 과정이 마침내 발명되었다... 더 값싸고 더 품질 좋은 종이가 생산되면서 도서 가격이 내려가자, 작가들은 훨씬 폭넓은 독자층의 구미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값싼 짚으로 만든 종이나 신문 용지에 인쇄되었던 선정주의적인 '싸구려 통속소설'의 경지를 넘어 이제는 질 좋은 종이에 인쇄된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문학 작품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결론은 에너지원의 문제로 끝난다.
"되돌아보면 역사의 흐름을 가른 단층선은 아마도 1600년경인듯하다. 바로 이때가 장작과 숯에서 얻은 에너지를 화석연료로 보충하기 시작한 시기다. 그러면서 점차 화석연료로 대체했다. 이런 과정이 촉진제가 되어 도시화가 진행되고 과학이 탄생했으며 자본주의가 부상하고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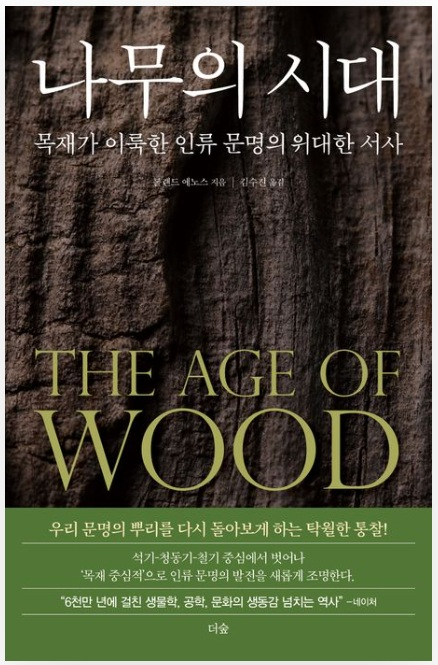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