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일'을 알고, 그 전에 있었던 '일',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가면서 어쩌면 저도 그 '일'들을 반복하게 된 사회 전체의 일원이지 않았나 생각했다, 영화를 만드는 내내,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
영화 <다음 소희>를 만든 정주리 감독은 '왜 이 작품을 다루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31일 서울 이촌동 용산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다음 소희> 언론배급시사회에서였다.
<다음 소희>는 정 감독의 9년 만의 복귀작이다. 데뷔작 <도희야>로 백상예술대상 등에서 신인감독상을 받은 감독이라 그의 후속작이 기대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음 소희>는 지난해 열린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해외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의문의 답을 찾아가는 영화 <다음 소희>
<도희야>가 아동폭력을 정면으로 다뤘다면, <다음 소희>는 청소년 노동에 천착한다. 둘 다 사회의 깊고 어두운 면을 다룬다. 차이점이 있다면 <다음 소희>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이다.
2017년 1월 23일 전북 전주 외곽에 위치한 아중저수지. 이곳에서 살얼음 수면 아래 마네킹처럼 딱딱하게 굳은 여성이 사진가에 의해 발견됐다. 전날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나섰다가 행방불명된 열아홉 살 여고생이었다.
경찰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인 22일 오후 6시께, 스스로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저수지에 몸을 던진 여고생은 죽기 직전, 저수지 둑이 바로 보이는 카페에서 10여 분 정도 머물렀다. 그곳에서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건넨 뒤, 저수지로 향했고 이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여고생이 자기 몸을 던진 날은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다. 구름 깔린 하늘에서는 소낙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고 있었다. 그런 우울한 날씨에, 인적도 드문 저수지에 왜 자기 몸을 던져야만 했을까.
<다음 소희>는 그 의문의 답을 찾아간다.
영화는 1부 현장실습에 나간 소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2부는 경찰(유진)이 소희의 죽음을 파헤치는 이야기로 나뉜다.
영화를 보다보면 새삼 정주리 감독의 시나리오와 연출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영화에서는 누구도 악인은 없다. 소희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이도 없다. 모두가 자신의 상황과 지위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것을 정 감독은 세세하게, 그리고 덤덤하게 그려나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최선'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무도 소희 등을 떠밀지 않았으나, '선의'로 포장된 모두에 의해 소희는 떠밀려져 저수지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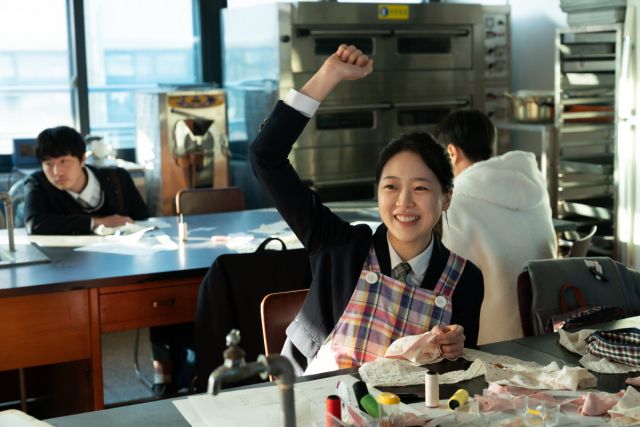
<다음 소희>가 나와야 하는 이유
영화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아마도 경찰 유진이 분노하는 장면인 듯하다. 소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유진은 소희 사건을 접하고 곧장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 그러다 하나둘씩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소희가 일한 콜센터를, 그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모순된 현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한다.
"왜 아무 말 안했냐고, 왜 가만히 있었냐고."
부들부들 떨면서 장학사에게 외치는 유진의 목소리는 현실을 알면서도 외면한 어른들과 우리 사회를 향한다.
절규하듯 외치는 유진을 보면서 그간 '소희'를 알지 못했던 '우리'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진다. 알지 못했기에, 알면서도 외면했기에 죄책감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다음 소희>가 관객에게 던지는 무거운 메시지다.
정 감독은 기자간담회에서 "소희 한 명만의 사건이 아닌, 그런 사건들이 영원히 반복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묻는 게 있었다"며 이 영화를 찍을 당시 발생한 사건을 소개했다.
"여수에서 요트 바닥에 있는 따개비를 따다가 한 학생이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고 분노했고 장관이 사과까지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잊힌 사건이 되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참담했다. 하지만 어쩌면 <다음 소희>가 나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기도 했다."
<다음 소희>는 2월 8일 개봉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