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칠드런 액트>(이언 매큐언 지음, 민은영 옮김, 한겨레출판 펴냄)의 주인공, 59세의 판사 피오나는 어려운 판결을 앞에 두고 있다. 영국에서 성인의 기준인 18세를 불과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애덤에게 수혈을 강제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가 18세를 넘긴 성인이라면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며 자신의 의사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성년이 아닌 애덤은 신실한 여호와의 증인 부모와 성직자들에 둘러싸여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일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먼저 파악하고 있던 병원이 그를 강제 수혈로 치료할 수 있도록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다.
법은 사회적 구성물이므로, 공동체가 사안을 대하는 모습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서구와 달리, 우리 대법원은 최근 '환자가 수혈을 거부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의사가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환자 보호 의무를 같은 기준에서 형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국과 달리 독일의 경우는 또 달라서, 성인은 물론 14살 이상의 '자연적 통찰력'을 지닌 미성년의 수혈 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영국의 애덤은 성년에 거의 도달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주인공 판사의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법관의 역할은 아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종교적 가치와 미성년 아동의 복지가 정면에서 충돌하는 이 사건의 딜레마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지적하며 책의 해제를 쓴 법률가 금태섭은, 판사는 자신의 가치대로 주관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어 '어떻게든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자'라고 쓰고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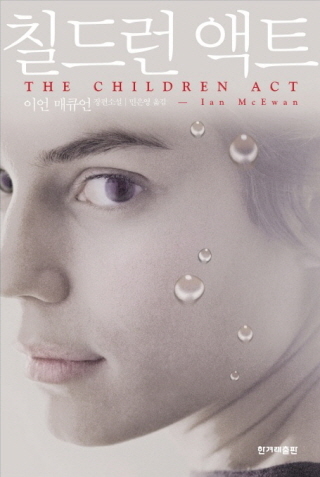
법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냉소적인 인식과 사생활의 실패가 복잡하게 겹쳐져, 피오나는 결국 당사자 애덤이 죽건 살건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까지 잠시 하게 된다. 어차피 아이가 죽은 후에도 다른 이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를 사랑했던 가족들조차 나이 들고 죽어가면서 슬픔도 후회도 추억도 점점 옅어지다가 아무런 의미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도저한 현실 앞에서 자신이 하는 재판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피오나는 회의한다.
3.
직업 법률가로서 구분되는 판사 일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그들이 자신의 일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수동적인 사실이다. 법관들은 법원에 접수되는 순서대로 자신의 사건을 무력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숙명과도 같아서 판사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사건만 다루거나 혐오하는 사건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사건들 중에는 이미 확립된 법리와 일반 시민의 기준에서 확고한 가치관에 따라 일도양단식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건도 존재하지만,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애덤 수혈 류의 사건도 있기 마련이다. 법관이 어떻게 당면한 판결을 미룰 수 있겠는가. 강제 수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판사의 일'이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매일같이 앞에 두고 일상을 사는 피오나를 향해 '내일 아침에 그런 사건을 하나라도 다루고 판결해야 한다면 오늘밤 한숨도 못 자고 손톱을 물어뜯고 술을 축낼 것'이라고 조소하는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오나는 법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애덤 사건을 심리해내고 그를 살려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후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결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피오나의 말대로,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무력한 재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4.
말하자면, 판사는 한국에서도 영예로운 직업이며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권위 부재의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는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고 전제한다면 더욱 그렇다. 과거 판사는 사법연수원 경쟁 시험 결과 1등부터 100등까지만 허용되는 직업이었다. 오직 연수원 시험 성적이 좋은 이들에게만 판사라는 영예로운 직업이 허용되었는데, 연수생들은 수능 대학배치표가 그랬던 것처럼 순서대로 판사-검사-변호사 직을 착하게 줄 맞추어 선택했다. 사실 판결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민의 의무를 실행해야만 하는 자로서 그 영예로운 자격을 부여받는 법관을 선발할 때, 오로지 성적을 우선하는 것은 조금 위태로워 보인다. 피오나가 해야만 했던 판사의 일을 떠올려보자. 법조일원화 취지에 따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변호사 경력을 거친 자만이 판사로 보임할 수 있게 된 지금, 시민들이 새로운 법관 선발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떤가.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