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국회의원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닮아 있다. 물론 택시 기사에 대한 불만은 편견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 양심적이고 좋은 기사님들이 훨씬 많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논쟁이라도 벌일라치면, 불쾌한 경험을 한 이들이 혼을 담아 토해내는 진저리를 이기기 어렵다. 최근의 '타다' 논란이 결국 검찰 수사로 귀결되고 있지만, 여론이 택시 업계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이유다.
그러면 해법은 뭘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자.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 자질 미달인 기사들이 많다. 택시 수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정말 그럴까? 심사를 강화해 택시 수를 줄이면, 불쾌한 경험을 한 이들의 속이야 시원해질지 몰라도 문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수가 줄어들어서 귀해진 택시는 더 마음대로 영업하며 돈을 벌 것이고, 손님에게 '갑질'을 해도 울분을 참으며 불친절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택시 수를 늘려서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이 원칙적으로는 옳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수가 적던 시절에는 돈을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을 '선생님, 선생님' 하며 떠받들었지만, 수가 늘어나니 이제 변호사·의사들도 제법 친절해졌다.
이런 면에서 보면, 최근의 '의원 정수 논란'은 기묘한 착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절대 다수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원 정수에 '정답'은 없다. 유권자들의 뜻을 따르는 게 옳다. 다만 유권자들이 이런 응답을 하는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문제다.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의 국회가 제공하는 의정 서비스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불만족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 '택시 서비스가 형편없으니 택시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의원 수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들도 많다. 지난달 30일 <동아일보>는 "현재 의원 한 명의 세비는 1년에 1억5176만 원. 300명분의 총액을 유지한 채 330명이 나눠 가지면 의원 1명은 1억3796만 원의 세비를 받게 된다"며 "세비 외 의원에게 투입되는 다른 비용은 보좌직원(8명) 인건비 약 4억8195만 원, 입법활동 지원 및 의원 사무실 운영 등 약 9837만 원으로 1인당 총 5억8032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의원 30명을 증원하면 연 174억960만 원, 의원 임기 4년 동안 총 696억3840만 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는 '보좌진 인건비 등을 포함해 국회에 배정된 예산 전체 총액을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설사 <동아일보> 계산대로, 추가로 뽑히는 의원 1인당(의원실 증가 1개당) 약 6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결코 감당 못할 수준의 정치개혁 비용은 아니다.
행정적으로만 봐도, 2020년도 한 해 정부 예산안은(제출안 세출 기준) 513조5000억 원이다. 현재 300명의 의원들이 1인당 각기 1조70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셈이다. 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잘 감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인건비·사무실 유지비' 6억 원보다 과연 적을까? 6억 원을 더 쓰고 고용한 의원이, 예산 1조 7000억 원 중에 100억 원만 절감해도 정치 효용성과 효능감은 높아질 수 있다.
행정 효율 측면뿐 아니라, 의원 1인당 인구 숫자를 낮춰 유권자 대표성을 높이는 차원의 정치적 의미도 있다. 한국의 의원 1인당 국민 수는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고 최하위인 31위이다. 한국 국회의원 1인이 국회에서 대변해야 할 국민은 2015년 기준 16만7400명이었다. (인구는 늘었고 의원 수는 그대로이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면서 왜 내 뜻과는 다른 소리만 하느냐'는 원초적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봐도, 정부·공공기관·재벌에 대한 의회의 감시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감시를 받는 측'이 감시자들을 포섭·매수·설득하기 쉬워진다.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고, 때문에 '그나마' 유권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들이다. 시험을 잘 보거나(관료·판검사), 부잣집에 태어났다는(재벌) 등의 이유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누리는 이들과의 근본적 차이다.
보수 진영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의원들 밥그릇 지키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 혐오 정서에 편승한 선동에 불과한 것은 그래서다. 지금 1명인 대통령을 2명으로 늘리면 '대통령 밥그릇 지키기'일까? 만약 '2인 공동 대통령' 체제가 된다면, 지금 대통령이 가진 권력은 강화될까, 약화될까? 대법관 수를 늘리면 지금의 대법관들은 과연 좋아할까, 싫어할까? 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배분하는 게임이고, 그 '분배 대상자'들의 수가 늘면 이들 1인이 나눠 갖는 권력은 오히려 작아진다. 그래서 '정수 확대'는 본질적으로 '권한 축소'이기도 하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국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국회의원이 100여 명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그를 비롯해 정치 개혁을 고민해온 많은 이들이 결국 도달한 결론이 '의원 정수 확대'라는 점을, '정수 확대는 기성 정치인 밥그릇 지키기'라는 주장에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보길 권한다. 어제 탔던 택시 기사가 불친절하다고 해서 택시 숫자를 줄여 버리면, 앞으로 좋은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으려 해도 그들의 진입장벽만 높아질 것이고 우리도 택시 잡기만 더 불편해지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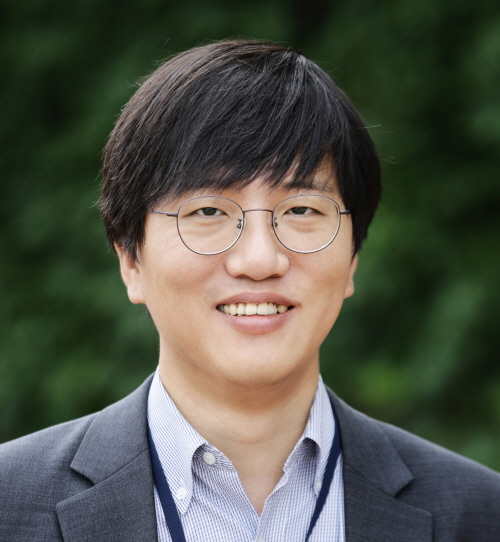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