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이별이 시작된건 한참 전이다. (양)아버지께서 맨 먼저 돌아가셨다. 다음으로 (친)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얼마 전에는 동생이 나를 앞질러 세상을 떴다.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리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죽음이라는 본질을 회피하려 든다.
"인간은 평생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걸 부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 (롤란트 슐츠, <죽음의 에티켓>)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은 죽음에 침묵한다. 지난해 졸저 <상속설계>를 출간하면서, 첫 문장을 "나는 죽었다."로 시작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상황을 가상했다. 나는 한 챕터로 마무리했었는데, <죽음의 에티켓>은 250페이지짜리 한 권의 책으로 구체화했다.
죽음의 실제 과정을 단계별로, 보편적으로, 인간학으로 철저하게 정리해낸 훌륭한 책이다. 내 죽음을 상상할 때가 있다. 이런 죽음이었으면 할 때도 있다. 황동규 선생의 <풍장> 같은 모습이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아이들의 외증조할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와의 이별을 슬퍼한 나머지 집안 부엌에 '풍장'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전해들은 적이 있다. 물론 내가 말하는 풍장은 그 정도는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바람' 그 자체다.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순백의 눈도 녹으면 질척거리는 것을/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복효근, 〈목련 후기〉)
그렇다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없는 것일까. 저명한 의사이자 작가인 아툴 가완디의 말이다. "아름다운 죽음은 없다. 그러나 인간다운 죽음은 있을 수 있다." 대학에서 성직후보생들에게 사회윤리학을 가르쳐온 또 다른 저자 박충구 선생은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한 열세가지 질문을 <인간의 마지막 권리>로 정리했다. 죽음에 대한 평화로운 성찰록이다. 시공을 넘나드는 인용이 대단히 적절하다. 그래서 인용이 잦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할 이들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장례식 날 데리다의 아들이 그 편지를 읽었다.
데리다는 편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대들을 향하여 미소를 짓고 그대들을 축복하고 그대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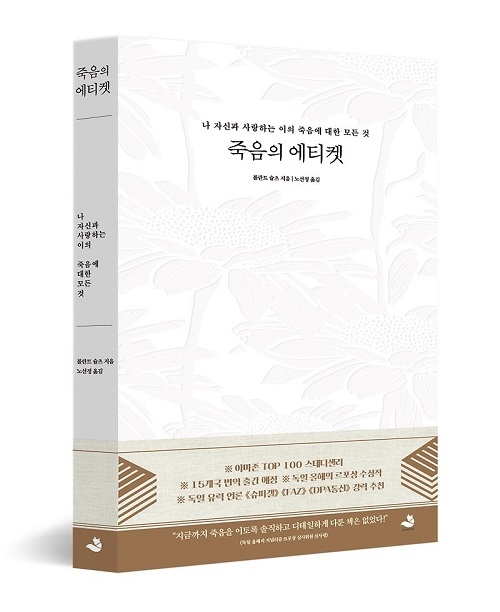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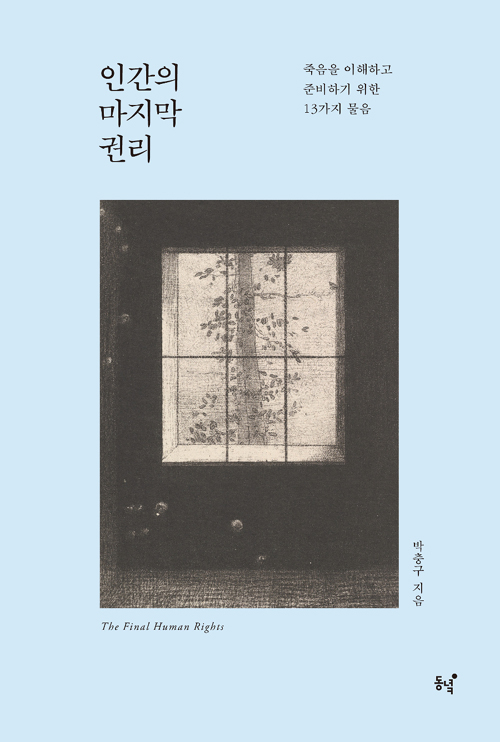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