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에 이어 ‘사이시옷’의 쓰임에 관해 계속 설명하기로 한다. ‘사이시옷’의 경우는 발음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는 ‘머리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주로 ‘미용실’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말 사용하는 업소가 많이 늘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머릿방이라고 쓰지 않고 머리방이라고 쓰고 있다. 주로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는 등 머리를 손질해 주는 곳’을 말한다. <머리 + 방>의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다. 우리말에 또 하나의 ‘머릿방’이 있다. 형태도 똑같이 <머리 + 방>의 모습으로 미용실과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안방 뒤에 붙어 있는 방’을 이르는 말이다. 이럴 경우에는 ‘머릿방’이라 쓰고 발음도 [머리빵] 혹은 [머릳빵]으로 해야 한다. 동일한 형식의 글자들인데 의미에 따라 어느 것은 ‘ㅅ’이 들어가고, 다른 것은 ‘ㅅ’이 없다. 발음도 미용실을 의미할 때는 [머리방]이지만, 잠을 자는 방을 의미할 때는 [빵]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발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래, <보랏빛 엽서>를 보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보랏빛’이라고 할 때 발음은 [보라삗]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라+ㅅ+빛]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주에 이어 ‘한글맞춤법’ 규정을 먼저 보기로 하자.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병 머릿방 뱃병 봇둑 사잣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촛국 콧병 탯줄 텃세 핏기 햇수 횟가루 횟배
위의 규정을 통하여 보면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는 사이시옷(ㅅ)을 붙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귓병이나 뱃병 등은 이미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웃방, 아랫방, 머릿방을 통해서 방(房)과 관련된 단어도 한자어와 합성이므로 ‘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촛국은 식초(食醋)처럼 맛이 지나치게 신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초(醋)가 한자어이고 ‘국’이 우리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 규정상 옳다. 다음으로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곗날 제삿날 훗날 툇마루 양칫물
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비음(콧소리:ㄴ,ㅁ,ㅇ)으로 인해 ‘ㄴ’ 이 덧나기 때문에 앞말에 ‘ㅅ’을 덧붙이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발음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제산날], [양친물], [훈날] 등으로 발음하는 것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양치물]이라고 발음하려면 ‘ㅅ’이 없어야 한다.
이어서 다음의 경우도 비슷한 예로 볼 수 있다. ‘ㅇ’도 콧소리이므로 위와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욋일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우리말은 콧소리와 만나면 앞뒤의 자음이 콧소리로 발음하는 현상이 있다. 이를 비음화현상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말은 콧소리와 만나면 주변의 소리가 다 콧소리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콧소리가 세력이 강한가 보다.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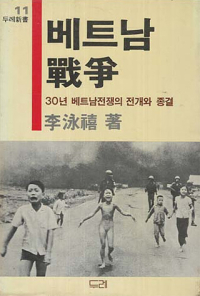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