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한국 사회에서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고강도의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을 말하게 된 데에는 체제적 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emerging) 인수공통 감염병이 나타나는 데에 생태계를 교란, 파괴해왔던 인류의 활동이 핵심 역할을 해왔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불평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협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깨달음이 대표적이다.
인류가 자랑하는 최첨단의 생의학 기술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없고 결국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국제적으로 확인되었다. 백신 개발 이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비약물적 수단은 코로나19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고, 실은 지금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런 사회적 기술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 역시 선명해졌다.
감염과 전파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고민도 한층 깊어졌으리라 믿는다. 지속되는 감염 확산의 위기와 도전 속에서 우리는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아픈 몸을 숨게 함으로써 위기를 조장할 뿐임을 배웠다.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 규범을 넘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존엄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과학적 원칙이며, 이때의 우리는 전 세계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류는 여전히 힘겹게 익혀가는 중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도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 그중 하나다.
과거 HIV 감염은 후천성면역결핍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여겨졌다. 근래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HIV에 감염되어도 조기 발견, 치료를 받는다면 비감염인과 비슷한 수명을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끝났다! 이제 만성질환으로 HIV 감염을 다루자"고 말한 지도 오래다.(☞ 바로 가기 : The end of AIDS: HIV infection as a chronic disease)
감염 전파에 대한 우려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낮아졌다. 감염인이 약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혈액 속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적어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감염전파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담는 구호가 "U=U"이다. 간단한 이 구호는 '검출되지 않으면(Undetectable) 감염되지 않는다(Untransmittable)'는 혁명적인 과학적 진실을 담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으로 잘 알려진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대규모 임상시험과 코호트 분석을 토대로 U=U를 검증하고, HIV 유행 종식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파우치 박사 등 유수의 전문가들은 "U=U"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치료가 곧 예방(treatment as prevention)"일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가기 : Dr. Fauci Discusses Ending the HIV Epidemic from the 2019 IAS Conference on HIV Science)
HIV 감염을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해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이 2020년 발행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HIV 감염 진단을 늦추고, 제대로 된 의료이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바로 가기 :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HIV 감염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식은 아직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듯하다. 여전히 HIV/AIDS를 불치의 병처럼 말하고, 감염병의 원인으로 동성애를 탓하는 이들이 공론장에서 버젓이 발언권을 얻고 있으니 말이다. U=U를 통해 과학은 감염인의 성교 형태가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되지 않음을 증명했다. 성교가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 행위라는 설명은 비과학적 주장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현행법은 오래된 비과학적 편견을 담고 있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규정된 "전파매개행위 금지"가 대표적이다. 이 조항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며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도대체 전파매개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조항은 감염인 당사자와 공동체, 이들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해롭다. 전파매개행위 처벌은 HIV감염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HIV감염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감염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진단과 치료를 꺼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의 관점에서도 해롭다.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전파매개행위 처벌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바로 가기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질병은 범죄가 아니며, 처벌은 낙인을 강화할 뿐 모두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실은 모든 감염병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환자와 접촉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상당하다. 우리는 시민들의 혐오와 공포를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정치가 문제라고 판단한다. 이런 정치는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시도하기 보다 부분적 근거를 공포를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하며 차별과 혐오를 양산한다. 그야말로 적극적인 '알지 않기의 정치'다.
HIV에서도 마찬가지다. 치료가 곧 예방이 되는 만성질환으로 HIV 감염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회는 감염인들을 부당하게 처벌하고 배제한다. 그것이 정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비판에 더해 누가 어떤 이유로 HIV 감염을 몰라도 되는 질병, 그저 혐오하고 차별하면 되는 질병으로 만들고 있는지 묻고 살펴야 한다. 차별과 처벌을 통해 지키려는 체제는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맞이하게 된 이번 세계 에이즈의 날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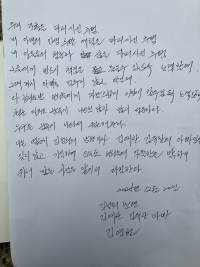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