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불편한 존재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젊음에 노년이란 청년을 착취하는 탐욕스러운 이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임산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노인, 옹고집 때문에 '곧 죽어도 새누리당'이라며 나라의 미래를 거덜 내려는 이다.
각자의 부모에게 갖는 성향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노인은 하나의 불쾌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늙음은 추함과 동의어가 되었고, 노인은 무언가 모자란 존재가 되었다. 배척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마땅히 사회의 온갖 병리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 우리는 자신이 늙어 죽으리란 걸 잘 알면서도 늙음을 적대한다.
이 불쾌함을 걷어내 보자. 놀랍게도 노인에 관한 이미지가 더는 남은 게 없다. 우리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노인이 중심이 되는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문명을 꾸렸다. 이 사회에서 늙음은 존중의 대상이고, 현명함의 대상이었다. 어느 문명에서나 늙음은 특정 집단을 대표했다.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늙음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건 지나친 비약일까.
신경과 전문의 김진국 대현첨단요양병원 과장의 신간 <기억의 병>(시간여행 펴냄)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늙음과 죽음을 다룬다. 저자가 의료 현장에서 다루는 일에서 얻는 고민을 기록하고, 사색을 풀었다.
책은 부제로 치매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다루는 주제는 늙음이며, 삶의 질이다. 저자의 다른 책을 읽은 이라면 이미 알겠지만, 이 어려운 주제를 저자는 문학과 지식을 곁들인 따뜻한 글로 풀어냈다.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늙음이 문제가 아니라, 병든 우리 사회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질주하는 현대 문명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늙음은 현대 문명에서 배척당할 운명이었기에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환자에 치여 살아가기 바쁘리라 여겨지는 의사의 송곳 같은 통찰이다.
실상 그렇다. 우리는 늙음에서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은 노인을 연상할 수 있다. 옛 시대는 노인의 경험이 중요했기에, 사람들은 그의 경험을 숭상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 단말기로 글자를 툭툭 터치하기만 하면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쌓은 모든 지식을 단 몇 초 만에 얻는다. 노인이 있을 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노인은 병든다. 신체가 사그라지는 것보다 더 무섭게, 정신이 쪼그라든다. 어눌한 노인에게 고리눈을 뜨는 우리를 향해 저자는 나쓰메 소세키가 런던에서 겪은 공황을 설명한다. 메이지 유신으로 갓 근대의 발걸음을 옮겼던 동아시아 구석의 청년이 세계 제국의 수도에서 체험한 건 열등감과 공포였다. 소세키는 결국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정신적 충격에 내리눌린다. 우리도 처음 외국에 가서 (각자 차이는 있겠으나) 이와 같은 생경함을 겪지 않았나. 노인에게 현대 사회의 전부가 이와 같다. 이 압도적 경험에 짓눌린 그들은 대부분 위축되고, 일부는 고함을 지르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외계에 홀로 떨어진 노인은 자연히 어눌해지고, 나이 듦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억력 감퇴는 의료 상업화가 극에 달한 이 시대로 인해 치매라는 병으로 정의된다. 저자는 급증하는 치매 환자 중 실제 치매를 앓는 이가 몇이나 되는가는 우리 사회 누구도 알기 어렵다고 일갈한다.

책 곳곳에 녹아든 병든 사회를 바라보는 저자의 의식에서는 간접적으로 대쪽같은 선비의 고상함이 연상된다. 노인 전문 병동이 정부 목표치의 네 배에 달할 정도로 번성했으며, 이들 병실이 사실상 '사회적 입원'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고려장을 대체하는 기관이 되었다는 저자의 풀이에서는 숙연함을 느낀다. 문장의 아름다움, 저자의 주제의식에서 이 책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아툴 가완디 지음, 김희정 옮김, 부키 펴냄)에 한 치도 모자람 없다.
우리는 빛과 같이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어쩌면 이른 시간 내에 우리의 생명을 극적으로 연장할 혁명적 변화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아니 세계의 모두는 늙음을 불안한 파멸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고령 사회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 사회는 문제임을 전제한 것 아닌가. 그러나 사회적 짐이 되어버린 이 늙음이 많아질수록 늙음은 더 중요해진다. 우리 모두가 결국 늙고, 병들어, 희미한 기억에 의존한 채, 죽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나아가 늙음에 한 시라도 더 빨리 대비하는 사회가 필요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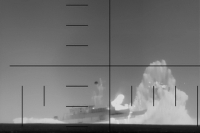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