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모든 신문의 1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단이 탈레반에 피랍되었다는 소식으로 도배가 되었다. 이 책은 절대로 과학 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저자 덕분에 과학 책으로 분류되고 심지어 연말에는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가 선정한 '올해의 과학 책'에 뽑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대부분의 신문이 놓친 정작 중요한 책은 따로 있었다. <이보디보 : 생명의 블랙박스를 열다>(션 캐럴 지음, 김명남 옮김, 지호 펴냄)가 바로 그것. <동아일보>만 11줄의 작은 상자 기사로 다루었고, 전날인 금요일자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6~7줄 정도로 짧게 소개했다. 문제는 9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이보디보, 생물학의 통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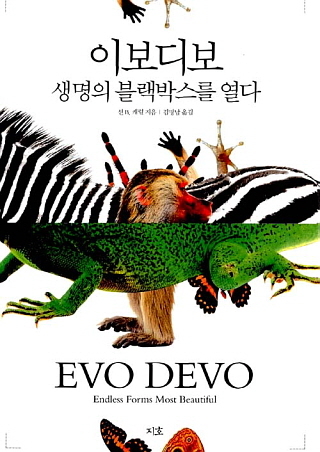
1859년 찰스 다윈은 진화 생물학의 경전인 <종의 기원>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빅토리아 시대의 기존 사회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진화 이론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철학, 경제학, 예술 등 모든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마침내 진화 생물학은 생물학의 종교가 되었다. 진화 생물학은 <종의 기원>이라는 거룩한 경전과 찰스 다윈이라는 선지자의 힘으로 생물학을 통일시켰다.
하지만 신흥 종교들이 대개 강력한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면 소멸되거나 분열하듯이, 진화 생물학 역시 '유전학'과 '발생학'이라는 두 종파로 분리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다수파는 '유전학'이었다. 20세기 초의 대표적인 유전학자 모건은 "낡아빠진 사유를 통해 자연사 문제를 다루는 식으로는 진화를 객관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면서 발생학을 낡은 학파로 몰아세웠다.
유전학은 도시로 진출했다. 하지만 도시는 이미 여리고성과 같은 강고한 '창조론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유전학은 이들과 '창조냐, 진화냐?'라는 지루한 싸움을 하였다. <종의 기원>이라는 경전과 더불어 '고생물학', '집단 유전학', '분자 생물학'과 같은 새로운 복음이 비록 있기는 했지만 나팔 불며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반을 돌기에는 복음이 부족했다.
이에 반해 소수파인 '발생학'은 속세를 떠나 깊은 산골에서 수도 생활을 했다. 그들은 그레고리 멘델이 완두콩을 키우듯 수정란과 배아를 정성껏 키웠지만, 진화에 관한 그들의 주장은 기껏해야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헤켈의 '계통 반복설'로 교과서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 심지어 복제양 돌리가 태어나고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전까지 '배아(embryo)'란 단어는 그저 낯선 전문 용어일 뿐이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는 법.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루이스가 초파리의 체절을 형성하는 '호메오(homeo)' 유전자를 발견하였는데, 유전학의 발달로 독일의 두 생물학자(에릭 위샤우스와 크리스티안네 뉘슬라인-폴하르트)가 이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 서열을 호메오박스라고 한다. 그들은 호메오박스가 세포 안에서 DNA→RNA의 전사(轉寫) 과정에서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공로로 그들은 199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발생학은 이제 더 이상 수도승에 머물지 않았다.
정치와 종교가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듯이 1990년대 들어 '유전학'과 '발생학'을 통합하려는 '진화 이론'의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이보디보'라는 새로운 종파다.
이 종파는 10여 년을 지하에서만 활동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복음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 이보디보 종파의 '바울'이 될 것인가? 1994년 <타임>은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의 유전학과 교수 션 캐럴을 지목했다. 그리고 과학철학자 마이클 루즈는 "다윈이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 가운데 한 명을 골라 하룻밤의 대화를 나눈다면, 션 캐럴만큼 적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캐럴은 마침내 2005년 <이보디보>를 썼다.
사람과 침팬지의 DNA가 거의 같다고?
이보디보 종파는 놀라운 사실들을 속속 밝혀냈다. 예를 들어 보자. 쥐와 초파리의 눈은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포유류의 눈은 복잡한 카메라 눈이고 초파리의 눈은 단순한 눈이 반복된 겹눈이다.
각각의 배아에서 눈의 발생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제거한 후, 쥐의 배아에는 초파리의 유전자(Eyeless)를 이식시키고, 초파리의 배아에는 쥐의 유전자(Pax-6)를 이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놀랍게도 생쥐 배아에서는 생쥐의 눈이, 그리고 초파리 배아에서는 초파리 눈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은 진화 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인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구조 유전자보다 스위치 역할을 하는 호메오박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목뼈의 수는 진화 생물학에서 오랜 수수께끼였다. 목이 키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린의 목뼈는 7개뿐이다. 게다가 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래의 목뼈도 7개다. 기린의 목뼈는 좀 더 많고 고래는 훨씬 적어야 하는 게 아닐까?
예전에 생명을 분류할 때 종-속-과-목-강-문-계라는 체계를 사용했다. 여기서 문(門)은 생명의 설계도에 해당한다. 지구상에 동물 문은 모두 38개가 등장하여 현재 37개가 남았다. 등뼈가 있는 척추동물문은 모두 같은 설계도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키와 상관없이 고래나 사람이나 기린의 목뼈가 7개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같은 척추동물이지만 조류는 목뼈가 7개가 아니다. 고니는 목뼈가 25개나 된다. 이것은 목뼈의 발생을 조절하는 혹스(hox) 유전자의 특성 때문이다. 혹스 유전자는 자유 라디칼에 의한 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 따라서 목뼈 수를 조절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배아 발생 과정에 암으로 유산하게 된다. 이에 반해 조류는 대사 과정에 자유라디칼 발생이 적어서 혹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
동물 성체의 해부학적 구조가 모듈성을 띠는 것은 배아 지리가 모듈성을 띠고, 스위치라는 유전 논리가 모듈성을 띠기 때문이다. 스위치는 특정 구조에서만 선택적으로 진화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도구이다. 스위치야말로 모듈성의 비밀이 간직된 곳이며, 모듈성이야말로 절지동물과 척추동물의 성공의 비밀이다. (252쪽)
이제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가 99퍼센트가 같아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기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그것은 발생학자들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이보디보는 이 사실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음이다.
<이보디보>가 끊임없이 독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은 모든 동물의 유전자가 무척이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인간에게서 어떤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면, 그 유전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침팬지와 생쥐 심지어 파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동물의 몸에서 튀어나온 부속지들의 형성에는 하나같이 D11유전자가 관련되어 있었다. 병아리의 다리, 어류의 지느러미, 해양 선충들의 부속지, 멍게의 병낭과 입수관, 성게의 관족 등이 다 그랬다. 몸통에 달려 있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는, 너무나 상이한 구조들을 형성하는 데 똑같은 툴킷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이다. (105쪽)
동물의 유전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진 것으로 서로 매우 닮았으며 지금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더 이상 '중간 화석'이나 '잃어버린 고리' 등을 운운하면서 지구 역사가 기껏해야 1만 년이라는 이야기는 제발 그만 하라! 진화는 '분자'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시험관에서 직접 재현할 수도 있다.
같이 읽을 책
이보디보를 소개한 책은 <이보디보 : 생명의 블랙박스를 열다>와 <지상 최대의 쇼 : 진화가 펼쳐낸 경이롭고 찬란한 생명의 역사>(리처드 도킨스 지음, 김명남 옮김, 김영사 펴냄, 2009년) 정도라고 보면 된다. 도킨스는 진화에 관한 많은 책을 썼지만 정작 진화의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따라서 진화의 최신 증거인 이보디보를 <지상 최대의 쇼>에서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화에 관한 한 션 캐럴은 현재 가장 독보적인 작가다. <이보디보 : 생명의 블랙박스를 열다>가 자신의 전공을 대중에게 보여준 책이라면 이어서 나온 <한 치의 의심도 없는 진화 이야기 : DNA와 진화의 확실한 증거들>(김명주 옮김, 지호 펴냄, 2008년)는 진화 일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진화론 산책 : 소설보다 재미있는 진화의 역사>(구세희 옮김, 살림Biz 펴냄, 2012년)는 모험과 탐험이 진화 이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책을 새로 쓸 때마다 더 쉽고 더 재밌게 쓰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것 같다.
션 캐럴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의 한국어 번역가들은 정말 최고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