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바로 그런 경우일 것 같다. 1949년 이후 중국의 역사는 성공과 실패의 양극단을 오가는 거대한 사건들과 위대한 인물들에 의해 포착되어왔고, 그래서 성공을 말하든 실패를 말하든 그 큰 것들에 가려 사람들의 삶은, 그러니까 작아서 전체에 비하면 미소하기까지 한 사람들의 삶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JPG)
|
| ▲ <중국을 인터뷰하다>(이창휘·박민희 엮음, 창비 펴냄). ⓒ프레시안 |
한때 마오의 구호에 열렬히 반응하는 문혁 조반파의 일원이었던 첸 리췬이 청년들과 함께 '민간사상촌락'을 만들어 중국인의 삶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실험하던 것도, 11년의 하방생활 속에서 체득한 농민들의 삶을 바탕으로 원 톄쥔(런민대 농업농촌발전학원 원장)이 소농사회주의를 주장하며 향촌건설운동을 하는 것도, 중국의 밖에 존재하는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저 '지하의 중국'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을 인터뷰하다>(이창휘·박민희 엮음, 창비 펴냄)에선 이보다 더 깊은 지하의 중국을 주시하고 그 속에 들어가려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거대한 깃발이나 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경계에 선 채,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 중국에선 결코 상영될 수 없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영화감독 장률의 시선 속에 있는 이들이 그들일 것이다. 고향을 떠나온 노동자(대개는 '농민공')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공부도 하는 '노동자의 집'과 그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동심실험학교'를 만들어 대학생 자원활동가와 더불어 배제된 운명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기운을 불어넣으려는 가수 쑨 헝의 가슴 속에 있는 이들이 그들일 것이다.
이들은 영웅들과 다른 사회주의의 꿈을 꾸는 '민간 사회주의'조차 가 닿지 못한 지하의 '민간'이고, 아직도 모든 사회주의의 꿈 '이전'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 착취당하는 인민이다. 농민들의 노동을 수합하여 '값비싼' 도시를 건설하곤 농민들이 그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만든 호구제도(후커우제도)는, 중세도시 이래 자본주의에서 진행되어 온 도시에 의한 농촌의 착취 관계를 사회주의 중국에서 더욱 강한 강도로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살아남기 위해선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은, 도시에 거주등록을 할 수 없는 불법이주민, 혹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도시민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서마저 배제될 뿐 아니라 더욱 값싼 상품의 노동력이 되어야 한다.
.JPG)
|
| ▲ 장률 감독의 2006년 작 <망종>. ⓒ장률 |
쑨 헝이 '농민공'이란 말에 분노하는 것은, 그들을 그토록 싸게 부려먹으면서도 언젠가 다시 '농민'으로 돌아가야 함을 상기시키는 이름이란 이유에서다. '순희'라는 이름의 인물로 형상화된 거리에서 김치를 파는 조선족 아주머니들은, 관료들에 의해 쫓겨 다니다 나중엔 자본이 만든 김치공장 때문에 그 쫓겨 다니던 거리마저 잃어버린다. 국가와 자본에 의한 이중의 배제. 영화 <망종>을 통해 이를 찍은 장률이 중국내 상영을 포기하면서까지 당국의 검열을 거부하는 것은, 이 이중으로 핍박받는 소수자들의 삶을 검열의 시선 아래 다시 한 번 꺾을 순 없다는 항의의 표시일 게다.
그래서 지하의 중국, 아니 '지하의 지하의 중국'에 대한 얘기들은 소문 이상으로 가슴 아프지만, 그런 이들에게 눈을 돌리고 자신의 삶을 건 이들이 있음을 보는 것은 절망을 먹고 자라나는 식물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 같아 슬프면서 기쁘다. 또 이 '미련한' 시도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여러 사람의 전언은 소문에선 들리지 않던 희망의 메시지 같아 반갑다. 이는 중국을 말하는 다른 책들에선 발견하기 어려운 것일 게다.
하지만 <중국을 인터뷰하다>에서 보여주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고 국가적 관점에서 말하는 중국과, 지하의 중국에 속하는 반대편 극이라는 두 개의 이미지의 대립으로 단순화되지 않는다. 최소한 또 다른 두 개의 다른 시점이 이 두 개의 시점과 다른 차원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복합적인 구도 속에 위치짓는다. 문화혁명과 하방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체험했고 그렇기에 '개방경제'가 야기한 그들의 고통에 진지하게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국가를 통해 중국 사회의 문제를 보고 국가적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이들이다. 첸 리췬이 말한 두 개의 중국 사이에서, 그 두 개의 극을 오가며 중국의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는 이들.
농촌문제와 농민문제가 응축된 것이란 점에서 농업문제를 '삼농문제'로 제기하며, 신향촌건설운동의 하방형 대중운동을 하는 동시에 당 중앙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추구하는 원 톄쥔이 상대적으로 농민대중에 가까운 지점에서 두 극을 오가고 있다면, 당정간부들에게 매년 일정기간 짧은 '하방'을 의무화하고 '혁명가요부르기'나 '범죄와의 전쟁' 등을 시행하여 '문혁의 재연'이라는 의심을 받는 충칭의 경험을 자본중심의 경제개방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시키려는 추이 즈위안(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은 상대적으로 국가적 관점에 서서 두 극의 간극을 좁혀보려는 시도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중국에서 지식인이 국가나 당의 바깥에서 중국문제를 사유하는 것의 어려움은, 우리가 짐작하는 바보다 훨씬 큰 것 같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민간 사회주의'의 편에 있다고 자처하며 츠이 즈위안 같은 '신좌파'와 거리감을 표시하는 첸 리췬조차, "중국의 현 상황에서 정부와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이는 국가의 외부에서 사유하는 것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하의 중국'을 말하면서도 국가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스스로 저지하는 이유기도 할 것이다.
.JPG)
|
| ▲ 첸 리췬(전 베이징대 국문과 교수.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망각을 거부하라> 저자). ⓒ정나원(창비 제공) |
또 하나의 극은 중국의 외부에서 중국 인민의 삶, 중국사회의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시하며 그것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다. 지나가다 휩쓸려 들어갔던 톈안먼 사태 속에서 처음으로 독립노조를 만들며 '주동자'가 되어 체포되었다 추방당해 외부자가 되었던 한둥팡('중국노동통신' 대표), 반대로 문화혁명 및 친중국파와의 대립 속에서 홍콩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시작했고, 홍콩이 중국에 편입됨에 따라 중국의 내부 아닌 내부 속에 들어갔고, 그런 조건에서 여전히 외부자로서 중국의 인민과 운동을 지원하고 그에 개입하려는 아포 레웅(홍콩 NGO 활동가)과 조셉 청(홍콩시립대 정치학과 교수)이 그들이다.
물론 네 개의 극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고 광활하기 그지없는 중국에서 길을 찾는 지도 전체를 요약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이들과는 반대로 공동체의 힘에 사로잡혀 개인적인 자유가 부재한 것이야말로 지금 중국의 가장 근본적 문제라고 보면서, 중국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주의자' 친 후이(칭화대 역사학과 교수)나, 중국이란 구도를 벗어나 '동아시아'라는 틀에서 중국을 보려 하는 쑨 거(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는 이 네 개의 극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사유의 방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국가와 인민, (국가의) 내부와 외부라는 네 개의 극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고려해야 할 최소항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 이는 중국 정부나 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중국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서방에서의 해석으로 중국을 이해하는 일방적이고 단조로운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의 현재에 대해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생각할 사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사회주의 혁명에서 당과 국가, 인민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 그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자와 농민, 특히 '농민공'의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적 깃발과 자본주의적 시장 사이에서 진행되는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문제,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 배제되고 착취당하는 인민대중의 문제 등 인터뷰이들이 논하는 많은 문제들을 나는 이런 구도 속에서 다시 읽을 수 있었다. 그게 아니었다면 국가를 통해 문제를 보는 이들에 대해 어쩌면 너무 안이하다 할 평가를 했을 것이고, 사회주의 중국에서 다시 한 번 이념의 무력함과 인간의 무참함에 절망했을 것이다.
<중국을 인터뷰하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사건이 있다. 문화혁명과 톈안먼 시위가 그것이다. 그 이전과 이후가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사건'이란 말에 강하게 부합한다. 이 책의 인터뷰를 읽다보면, 문화혁명 이후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영유하는 방식의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처럼 느껴진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이란 점에서 '운명'처럼 닥쳐왔던 이 사건들에게 대해 한결같이 진지하다. 아마도 그런 진지함이 자신이 겪은 사건을 쉽게 단순화하지 않도록 했을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을 펼쳐가는 과정에 어떤 깊이를 부여했을 것이다. 이들은 우리에게도, 닥쳐온 사건들에 대해, 혹은 닥쳐올 사건들에 대해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며 영유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은 단지 중국에 대해 단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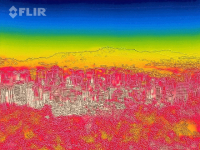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