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기는 모처럼 우리 글 쓰기에 관한 귀하고 좋은 책을 만난 덕분이다. 개인적으로 글쓰기에 관한 관심이 많았다. 글을 쓰고, 남의 글을 매만지는 일을 20여 년 했지만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서다. 학생 시절 작문 시간이란 것도 주어진 주제에 관한 글을 한 편 쓰는 걸로 때우는 식이었다. 이론 강의는커녕 꼼꼼한 첨삭 지도를 기대할 형편이 아니었다. 기자로 입문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어깨 너머로 본 것을 따라하면서 그때그때 선배들의 질책을 몸으로 익히는 정도였다.
글에 관한 콤플렉스가 많았던 만큼 관련 책을 부지런히 찾아 읽었다. 우리말 어휘집에서 문장론, 심지어는 실용문 쓰기에 관한 책까지 닥치는 대로 봤다. 그 중 이오덕의 <우리 글 바로 쓰기>(한길사 펴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좋은 글에 관한 생각이 바뀔 정도였다. <개나라 말 닭나라 국어>(효형출판 펴냄) 등 <경향신문> 교열 기자를 지낸 오동환의 책은 읽는 맛이 뛰어났다.
권오운의 <우리말 소반다듬이>(문학수첩 펴냄)는 굳이 따지자면 어휘에 관한 책이다. 단순한 낱말 풀이가 아니라 글쓰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설가들의 글에서 틀린 글, 어색한 표현을 용례를 들고 이를 바로 잡아 풀이한 형식이다. 그래선지 읽는 맛은 좀 떨어지지만 신인에서 중견, 대가까지 작가들의 실수를 가차 없이 짚어내기에 색다른 맛이 있다.
{#8983924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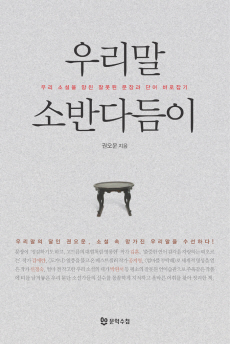
|
| ▲ <우리말 소반다듬이>(권오운 지음, 문학수첩 펴냄). ⓒ문학수첩 |
박금산의 소설집 <그녀는 나의 발가락을 보았을까>(자음과모음 펴냄)에 나오는 "여자를 안으면서 내가 이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란 구절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치하다' '바탕하다' '근로하다' 등 '~하다'를 붙여 쓰는 엉터리 말이 무슨 유행처럼 되어 버렸다고 개탄한다.
그의 엄정한 눈길은 김훈 등 인기 작가도 피해 가지 않는다.
"큰 놋주발 속의 돼지 염통은 싱싱해 보였다 (…) 놋사발 속에서 식은 말 피가 선지로 엉겨 있었다"(<남한산성>(학고재 펴냄))를 두고 '놋주발'은 무엇이고 '놋사발'은 또 무엇이냐고 묻는다. 놋쇠로 만든 그릇이 주발인데 다시 '놋(놋쇠)'을 붙이면 무슨 꼴이 되며,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을 뜻하는 사발에 놋을 붙이는 것은 무슨 우스꽝스러운 꼬락서니냐는 이야기다.
은희경의 "낙타 주머니에는 기름이 들었지만 지방이 연소되면 물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것이다"(<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창비 펴냄))는 '몬다위'나 '육봉'을 모른 탓일 거라며 낙타에 무슨 주머니가 매달려 있는가 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경린의 "캥거루 어미는 애기집 청소를 할 때 앞주머니를 벌리고 얼굴을 밀어 넣어 혀로 핥는다"(<엄마의 집>(열림원 펴냄))는 새끼주머니 또는 육아낭을 몰라 횡설수설한 것이되 '애기집'은 자궁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아기집'이 옳은 말이라 일러주는 식이다.
여느 '주례사 비평'과는 달리 톡 쏘는 맛도 일품이지만 책이 반가운 이유는 또 있다. 보석 같은 우리말을 만날 수 있어서다.
'바른 문장에서 우러나는 감칠 맛'을 좋은 소설의 조건으로 꼽는 권오운은 우리 소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 말 소반다듬이(소반 위에 쌀 따위의 곡식을 펴 놓고 뉘나 모래 따위의 잡물을 낱낱이 고르는 일)를 하는 욕가마리(욕을 먹어 마땅한 사람)가 되기로 했단다. 그 결과 박완서의 글에서 똘기(채 익지 않은 과실)를 찾고, 이문열의 소설에서 굴퉁이(겉은 그럴듯하나 속은 보잘것없는 물건이나 사람)를 뒤져내고 "의주 파천에도 곱똥은 누고 간다"란 맛깔스런 표현을 접할 수 있다.
반가운 한편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간 끊임없이 글쓰기를 공부하려 하면서 글을 썼지만 도무지 '바른 글'을 썼노라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학생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는 처지라 마옴이 더욱 불편하다. 하지만 솔직히 위안이 되기도 한다. 우리글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키워야 할 작가들조차 "설마?"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작지 않은 잘못을 수두룩하게 저지르는 마당이니 말이다. 나처럼 '정보 전달'을 위해 자주 쓰이는 일상용어로 글을 쓰는 보통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으랴 하는 생각조차 들어서다.
아, 물론 작가들에겐 나름의 명분이 있다. 책에 실린, 문학평론가 손정수의 '개인 방언론'이 그 중 하나이리라. 그는 염승숙의 소설집 <채플린, 채플린>(문학동네 펴냄)의 해설에서 "최근 소설에 등장하는 개인 방언들은, 그리고 그것이 그려 내는 개인 환상들은 유치하고 세련되지 못한 그 언어 그대로, 그 거칠고 투박한 그 상상 그대로 한국 소설의 새로운 국면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마도 소설가들의 신조어 능력과 그 가치를 높이 치는 말인 듯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 시대 각 도의 으뜸 벼슬이었던 관찰사 곧 감사를 빗댄 말인 '평안감사'를 '평양감사'라 하는(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창비 펴냄)) 경우 등, 틀린 말은 틀린 것이다.
서유미의 "나름대로 골라 입고 나간 것으로 기억하는데도 사진 속의 내 모습은 상당히 빈(貧)해 보였다" "선영은 원래도 몸매가 좋았는데 무슨 살을 그리 뺐는지 어깨선과 쇄골뼈가 앙상했다"(<쿨하게 한 걸음>(창비 펴냄))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도 권오운에 따르면 무책임한 표현이다. '빈티가 나 보였다'가 어울리고, 쇄골 자체로도 빗장뼈를 뜻하기 때문이니 섣부른 '개인 방언론'보다 지은이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반갑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부끄러운 것은 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접이 소홀했다 느껴서다. 이 책은 충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특히 도마에 오른 소설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였어야 한다. 우리글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이들이니 지은이의 지적에 항변이나 해명을 하든, 다음 책에 반영했어야 마땅하다. 책에 실린 글 중 상당 부분이 문학 잡지에 실렸고, 지은이가 기왕에 비슷한 책을 냈음에도 책이나 지은이나 각광을 받지 못한 것은 우리글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 부끄럽고 안타깝고 아쉽다.
시비를 위한 시비가 아니라 우리글을 아끼고 바로 쓰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졌으면 싶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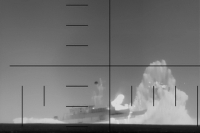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