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세계적인 사회인류학자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 정의하는 (학술)작업의 기조는 명징하다.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
암에 걸렸던 모양이다. 이후 얻게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적은 책이 <인생의 의미>다. 부제는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은 가슴 벅찬 7가지 깨달음'. 그래서 책은 7개의 챕터로 구성된다. 이중 몇 개의 문장을 발췌한다.
"역사학자 비에른 큐빌러는 속칭 '전투와 술병'이라는 연구 프로젝트... 주요 가설은 음주가 우정과 상호 이해에 꼭 필요한 윤활유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적당한 취기가 성공적인 외교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다." (관계)
"한 원로 작가는 평생을 모리셔스에서 보내며 바다에 관한 시로 명성을 얻었다. 어느 날 기자가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해변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왜 작가님이 사랑해 마지않는 바다를 보지 않으시죠?' '바다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결핍)
"나무의 삶은 느리다. 참나무는 자라는 데 200년, 사는 데 200년, 죽는 데 2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소설가 리처드 파워스는 <오버스토리>에서 나무의 속도로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대정신에 자욱한 깨달음의 꽃가루를 흩뿌렸다. 그에 따르면, 나무의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인간 세계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무의 느린 리듬은 그 정도로 혁신적인 대안인 것이다." (느린시간)
"인공지능은 농담에도 웃지 않으며 실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처럼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할 수 없다." (순간)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가 없을 때 균형은 이루어진다. (곰돌이 푸의 작가) A.A. 밀른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 밀른은 한 인터뷰에서 아주 작은 것을 보는 것과 아주 큰 것을 보는 것 사이의 기묘한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원자가 태양계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일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이 말은 내부가 외부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균형)
"인간은 벌거벗은 유인원도, 세력을 주장하는 존재도, 연대하는 생물도, 잔인한 포유류도 아니다. 무엇 하나로만 규정지을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를 정의하는 존재다." (실 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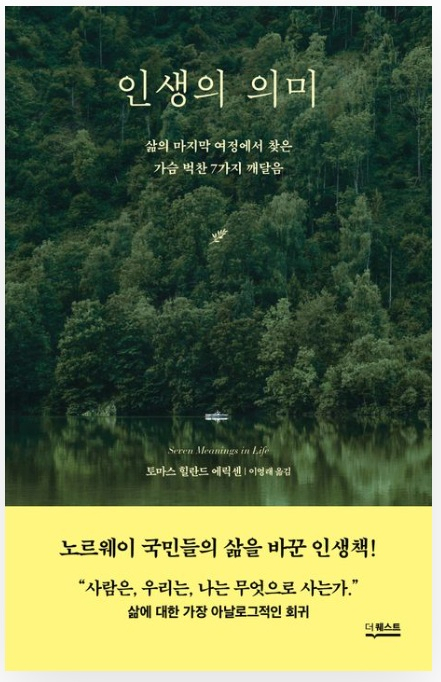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