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위의 법언은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이 쓴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나온 말이다. 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사회, 집단, 단체 등에 속하게 되어있으며, 그 구성원으로서 의 일정한 자격과 역할을 부여받으며 살아간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학생’이라는 명칭이 따라다니는데 이는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그에 걸맞은 자격과 역할(또는 의무)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단체,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역할과 의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존재한다. 단, 권리는 마치 보물찾기의 보물처럼 숨겨져 있어 평소에는 그 권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주장하고 요구해야지만 숨겨진 권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이라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수-학생-직원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권리’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숨겨진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않으면 있던 것마저 소멸되는 것이다.
대학원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대학원생은 ‘학생의 정체성’이 강조되어 공부만 하는 존재, 스승(지도교수)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흔하다. 대학에서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조교, 학회 간사로 일하는 것은 명백한 연구-지식노동이다.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그 권리를 덮어버리는 것이다.
2019년 12월 경북대에서 화학 폐시료를 폐기하던 대학원생이 전신3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꽃다운 나이에 대학에서 학생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다친 학생에게 주어진 치료비는 기존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최대 5000만 원만 보장했었다. 그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하면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는다. (치료비는 현재까지 약 10억원이 청구된 상태) 경북대는 사건 초반 연구실안전법에서 보장하는 한도를 근거로 일하다가 다친 소속 대학원생을 보호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었다.
이에 대학원생들은 ‘대학에서 일하다가 다친 대학원생들을 보호하라’고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학원생노조는 2020년 10월~12월 말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여 ‘학생연구원 산재보험’을 주장했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외침에 의해 2021년 3월 2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등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할 권리’을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었으며 마침내 그 권리를 쟁취하게 된 것이다.
대학원생 당사자의 권리 쟁취에 대한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
대학원생노조는 2019년 8월 1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북미지역 대학원생노동조합연합(Coalition of Graduate Employee Unions, CGEU) 연례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1992년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원생노동조합의 연합단체로 구성된 CGEU는 대학을 상대로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쟁취했다.
조교로 근무하면 대학원 등록금을 면제받고 생계를 해결할 만한 임금을 받는다. 가족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도 들어준다. 안경을 맞추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과 척추교정을 위한 마사지 등 생활에 밀접한 복지혜택도 노조가 얻어낸 혜택이다. 과사무실에서 교육조교나 장학조교로 일하면서 겨우 등록금만 면제되고 안전 상해 보장도 받지 못하며 개인 복지혜택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과 크게 대비된다고 할 것이다. CGEU의 사례는 한국의 대학원생 조교-학생연구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대학사회에서의 평등은 숨겨져 있는(혹은 누가 숨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찾을 것인가?에서부터 시작된다.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고 적절하게 부여된다면 대학 안의 평등은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다. 늦었지만 연구자권리선언은 대학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대학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려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다.
연구자권리선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zaVakXgC13Zq42Va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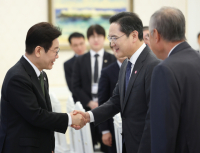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