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대중음악사에 굵직한 자취를 남긴 기타리스트들인 지미 헨드릭스와 제프 벡의 새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이에 <프레시안>은 이 두 음반을 평가해줄 분으로 언론인 고종석도 '이 시대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론지'로 극찬한 <딴지일보>의 논설우원 파토(본명 원종우)를 모셨습니다. 당초 이 글은 제프 벡의 첫 내한공연일인 지난 3월 20일을 전후해 내기로 돼 있었으나 예정보다 늦게 발행되었습니다. 요 근래 <딴지일보>가 뉴스 일일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데다, 워낙 사건·사고가 많아 바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힘들었다고 파토는 설명했습니다. 파토는 지난 1996년 한국 인디음악의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는 [One Man Band]를 발매한 1인 밴드 'Bad Taste'를 이끈 뮤지션이자, <딴지일보>의 핵심 논설우원입니다. 이번 연재는 제프 벡과 지미 헨드릭스, 두 편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글은 제프 벡의 신보 [Emotion & Commotion] 리뷰입니다. <편집자> |
소위 3대 기타리스트라는 말이 있다.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지미 페이지(Jimmy Page), 제프 벡(Jeff Beck) 의 3인을 일컬음인데,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낡은 개념임에도 끊임없이 회자되곤 한다.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걸쳐 생겨난 이 표현은 록 기타가 소위 각을 잡기 시작한 때, 즉 오버드라이브 걸린 강렬한 기타 솔로 연주가 처음 태동하던 무렵의 관점에 의한 것이다. 당시에는 이런 연주를 하는 기타리스트가 국제적으로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 3인의 영국인은 우연찮게 그 중심에 있었다. 크림(Cream)과 야드버즈(Yardbirds) 등 비틀즈(The Beatles)의 뒤를 이어 강한 하드록을 창조한 밴드들의 메인 기타리스트이자 중심 멤버였고, 그 명성에 어울리는 연주와 당대의 음악적 성과를 이뤄냈기에 3대 기타리스트라는 수식어가 지금까지도 쓰인다.
그러나 거물 밴드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음악적 리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미 페이지는 이미 20년 전에 현역 음악인의 생활을 접었고, 에릭 클랩튼은 본격파 기타리스트라기보다는 싱어 송라이터의 정체성으로 활동한 지 오래다. 그래서 이들 3인 중 지금까지 연주자로서 기타리스트 본연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은 제프 벡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런 그가 얼마 전 앨범 [Emotion & Commotion]을 발표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
| ▲제프 벡의 신보 [Emotion & Commotion]. ⓒ워너뮤직 |
허나 벡은 좀 다르다. 록스타라기보다는 외골수 이미지고, 거기에 어울리게 밴드 음악보다 기타 자체를 파고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록 팬 관점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면이 없지 않았다.
그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낸 때는 75년의 [Blow by Blow]에서다. 이 앨범을 처음 들은 것이 85, 6년 경이니 이미 잉베이 맘스틴(Yngwie Malmsteen)이 세상에 나와 있던 때고 그런 연주가 잘 치는 기타의 전형으로 여겨지던 시대다. 거기에 갑자기 제프 벡의 이 기묘한 음악…. 3대 기타리스트라고 하더니 뭐지? 도무지 음을 따라갈 수 없이 제 맘대로다.
하지만 호기심이 동해 벡의 이후 앨범들을 하나씩 찾아 들었다. [Wired], [There and Back], [Flash] 등. 음악에 익숙해져 가자 그의 진정한 천재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록도 아니고 재즈도 아니고 퓨전도 아니며 그 셋 다 이기도 한. 결코 한가지 음악에 안주할 수는 없었던, 허나 기존 장르들을 그냥 쫓아가기에는 너무 높았던 재능과 자부심이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 그저 제프 벡 음악이라고 밖에는 부를 수 없는 무엇.
생각컨대 그의 기타의 화두는 분명 '확장'이다. 기타가 건드릴 수 있는 음악적 영역들은 어디까지인가? 쟝르를 마구 뒤섞거나 곡마다 확연히 다른 연주들을 하는 세션맨적 접근이 아니라, 그 모든 경향들을 '벡류' 아래에 하나로 융합하면서 말이다.
크로스오버 연주자들은 얼마든지 있고 그들의 음악은 대개 테크니컬하다. 그러나 벡의 음악은 기교 대신 음색과 의표를 찌르는 프레이징으로 승부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창조적인 작업이고, 어렵고, 용기와 자신감이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7년만의 새 앨범 [Emotion & Commotion]도 그렇게 수립한 독자적인 음악세계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본작에서 가장 뚜렷한 점은 그 모든 음악적 경로를 거쳐 이제 일흔을 향해 가는 그에게 꽉 들어찬 일갑자 내공이다. 모든 연주는 예전보다도 훨씬 단순하고, 느리다. 복잡하거나 숨가쁜 것은 아무 데도 없다. 그 속에서 음 하나하나의 충만함에 모든 것을 건다.
그 연배에서 흔히 선택하는 맘 편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극히 현대적인 기타 톤과 트레몰로 암(Tremolo Arm), 볼륨 주법, 레가토(legato) 주법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분명한 21세기의 연주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여타의 애송이(?)들과 다를 뿐이다. 그의 손끝에 익은 모든 기교는 일체의 과시나 조급함 없이 음의 충실함와 농밀한 표현력,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CD를 플레이하면 일단 나오는 곡은 라이 쿠더(Ry Cooder)를 연상케 하는 슬라이드 기타 연주의 'Corpus Christi'. 핑거 피킹과 밴딩(Bending), 볼륨 주법이 같이 어우러져 라이 쿠더보다 더 쓸쓸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표현한다. 음, 이번 앨범은 이런 쪽인가?
하지만 이 곡을 듣고 난 후 내 눈에 익숙한 두 곡의 제목이 눈에 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와 'Nessun Dorma'.
'Somewhere Over the Rainbow'는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를 비롯한 재즈 아티스트들과 속주 기타리스트 크리스 임페리털리(Chris Imperitelli)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주자들이 리메이크해온 스탠더드 레퍼토리. 그들의 연주와 이 연주는 어떻게 다를까.
무엇보다 다른 버전들과 달리 흔히 애드립(ad-lib)이라고 말하는 빠르거나 기교적인 솔로가 전혀 없다. 노회한 벡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 멜로디만을 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음들을 다루는 그의 능력 앞에서 이전의 다른 화려한 연주들이 빛을 잃는다. 트레몰로 암으로 음정을 바꾸면서 자아내는 길고 긴 음의 아련한 느낌. 기타의 완급이 저런 식으로 조절될 수도 있었다.
'Nessun Dorma'.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Turandot)'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번역되는 유명한 아리아. 얼마 전 영국 'Britain's Got Talent' 에 출현했던 폴 포츠(Paul Potts)를 통해 대중적으로 더 알려졌다.
지금껏 클래시컬 음악을 일렉트릭 기타로 연주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교향곡이나 협주곡의 멜로디를 일부 차용해 쓰거나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 현악기 연주를 빠르고 테크니컬하게 카피하는 경우였다. 그런데 오페라 아리아라니.
사실 모든 악기 중 가장 표현력이 뛰어난 것은 인간의 목소리다. 그렇기에 일반인의 경우도 그리 어렵지 않게 노래에 감정을 싣는 것이 가능한 거다. 반면 악기는 신체의 일부인 성대처럼 자유자재로 조종하기는 어렵고 조음방식 자체의 한계도 있어서 표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곡은 20세기 최고의 테너 중 하나라는 루치아노 파파로티의 애창곡 중 하나라서 자칫 비교되기 때문에 기타리스트가 함부로 도전하기에는 부담 천만이다.
그럼에도 제프 벡은 튀는 변주나 기묘한 솔로 같은 것은 일절 포함하지 않고, 역시나 멜로디 그대로만 연주해서 성악에 준하는 풍부함을 끌어내고 있다. 벡 외에 누가 감히 이런 발상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설사 시도한다 한들 결과물에 쓴웃음이 나기 일수인데. 자기가 가진 음에 대한 전적인 믿음 없이는 결코 벌일 수 없는 도전이다.
이 자신감과 내공.
허나 앨범은 벡의 기타만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다. 또 다른 포인트는 뛰어난 여성 보컬리스트들의 참여. 네오 소울 아티스트인 조스 스톤(Joss Stone), 소프라노 올리비아 세이프(Olivia Safe), 이멜다 메이(Imelda May)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곡들은 벡 특유의 음악적 감각과 어우러져 독특한 색채를 발한다.
이 중 특히 훌륭한 것은 'There's No Other Me'. "네오 소울의 디바"라는 표현에 어울리게, 조스 스톤은 이 곡에서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과 록 보컬리스트 데이빗 커버데일(David Coverdale)을 합쳐 놓은 듯한 매력적인 목소리와 터프한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받는 보컬리스트에 의한 산뜻한 충격.
스케일이 크고 시원한 곡을 원한다면 'Hammerhead'가 쓸만하다. 헨드릭스 풍의 와와(Wah-Wah) 인트로로 시작해서 레드 제플린의 'Kashmir'를 연상케 하는(조금이지만) 현악 반주의 입체적인 음들 위에서 잔향이 깊게 먹힌 벡의 기타는 느릿느릿 절제된 음들을 뽑아낸다.
장중한 애잔함을 원한다면 올리비아 세이프의 목소리가 담긴 'Elegy For Dunkirk' 나 이멜다 메이와 함께 한 'Lilac Wine'를 듣자. 후자는 뒷부분 벡의 블루지한 솔로가 귀에 착착 감긴다. 한편 진짜 블루스를 듣고 싶다면 'I Put A Spell on You'가 있다. 전형적인 12/8 박자 계열 블루스인 이 곡에서 조스 스톤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다. 21세기의 세련됨으로 6, 70년대의 정서를 노래하는 이 가수는 아무리 칭찬해도 아까울 게 없는 보물.
기타리스트로, 아티스트로서 제프 벡은 이제 궁극의 위치에 오른 듯 하다. 이 앨범에 있는 곡들을 그대로 연주하는 것은 좀 숙련된 기타리스트들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 그 느낌들을 살려 내는 벡을 보고 있자면 그저 경외로울 수밖에 없다.
어려운 스케일이나 복잡한 코드 진행에 의지하지 않고 단순한 소리 하나하나를 마치 뜯어내는 듯 연주하지만 거칠거나 과장되지 않다. 세련되면서도 여물고,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의 향취를 풍긴다. 진정한 거장의 본색.
나를 포함한 모든 기타리스트들의 꿈은 아마 저렇게 늙어가는 것일 거다. 다만 능력이 따르지 못할 뿐.
.JPG)
|
| ▲ ⓒ워너뮤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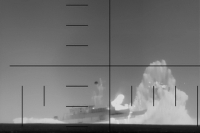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