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사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첫 경험이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뒤, 경영 의사 결정을 주도한 첫 사례. 평생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게다.
'을'의 입장이 된 경험이기도 했다. 삼성은 그간 소액 주주들에게 뻣뻣한 편이었다. 비슷한 위상을 지닌 외국 기업과 비교할 때, 그렇다.
삼성물산이 주주 총회에서 민원을 제기하려는 소액 주주를 미행하고 겁박하다 들통이 난 게 지난 3월이다. 불과 넉 달 전이다. 그리고 지금, 삼성물산은 단 한 주만 지닌 주주에게도 고개를 숙인다. '을'이 됐다. 엘리엇 덕분이다.
소액 주주 겁박하던 삼성, 이젠 소액 주주에게 굽신
오는 17일 주주 총회에서 엘리엇과 표 대결을 앞둔 삼성물산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45%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에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필수적이다.
합병 안이 통과되려면,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한다. 주주 총회 참석률이 70%라면 전체 지분의 46.7%, 80%라면 53.3%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삼성 입장에선 아슬아슬하다.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는 대부분 입장을 정했으므로, 열쇠는 24.4%를 차지하는 소액 주주들이 쥐고 있다.
이들은 입장이 유동적이다. 감정적인 호소가 먹힐 여지도 있다. 최근 일간지, 방송, 포털 등에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을 겨냥한 광고가 쏟아지는 건 그래서다. 실제로 삼성물산 직원들은 주주들을 직접 만나러 다닌다. 소액 주주를 겁박하던 삼성물산 직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이재용의 첫 경험, 삼성엔 어떤 영향?
단 한 표가 아쉬웠던 경험. 평범한 회사원이 월급 털어 산 주식 한 주 때문에 경영권 승계 구도가 어그러질 뻔 한 경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낯선 경험일 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체제'를 전망할 때,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재용 체제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주주들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첫 출발부터 그랬으니까.
이는, '소액 주주의 목소리'가 반드시 재벌 개혁의 방향과 겹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재벌 총수 일가가 주주 가치를 노골적으로 훼손할 때는 '소액 주주의 목소리'가 일정한 개혁성을 띠었다. 상황이 바뀌면, '소액 주주의 목소리'는 다른 색깔을 띨 수 있다.
불안정한 경영권, '주주 눈치 보기' 피할 수 없다
삼성을 포함한 대개의 한국 기업이 그동안 주주들에게 인색했던 건 사실이다.
최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5월 31일 기준)은 평균 16.75%로 조사 대상인 51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았다. 1위인 체코(72.87%)와는 5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2위는 호주(70.91%)였고 핀란드(69.07%), 뉴질랜드(65.49%), 영국(63.36%), 포르투갈(63.26%)이 뒤를 이었다. 배당 성향이란 순이익 가운데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뜻한다. 배당 성향이 높아진다는 건, 회사 이익 가운데 주주의 몫이 커진다는 뜻이다.
한국과 문화가 비슷한 중국과 일본도 각각 31.57%(43위)와 27.96%(47위)를 기록했다. 한국과는 적어도 1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배당 성향이 13.0%다.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 IBM 등 글로벌 IT 기업에 비해 14~15%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 됐다는 점, 주력 산업인 반도체, 휴대폰 등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산업의 성장기엔 배당성향이 낮고, 성숙기엔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게 경영학 상식이다.
엘리엇 덕분에 미소 짓는 삼성 주주들?
이런 사정을 다들 안다. 그래서 '주주의 목소리'에 바탕을 둔 재벌 개혁 주장에는 배당 성향을 높이자는 내용이 종종 담겼었다. 그리고 삼성은 이런 주장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불안정한 경영권을 지키려면, 단 한 주가 소중하니까. 소액 주주들의 마음을 잡아야 하니까.
실제로 그렇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업 설명회(IR)를 열고 통합 삼성물산(합병 법인)의 배당 성향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거버넌스위원회(주주권익위원회)와 사회공헌(CSR)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산한 배당 성향은 21%였다. 이에 대해 지난 주말 판 <한겨레>는 "엘리엇의 공격이 없었다면"이라는 기사에서 "솔직히 엘리엇이 없었다면, 삼성이 부랴부랴 합병 이후 주주 친화 대책을 내놓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옳은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따져봐야 할 건 '주주 친화 경영이 꼭 좋기만 한가'라는 점이다. '엘리엇 사태'에 화들짝 놀란 경험을 안고 출발하는 '이재용 삼성회장 체제'는, 지금보다는 훨씬 주주 친화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은 없겠느냐는 게다.

'주주 친화 경영', "황금 알 낳는 거위, 배 갈랐다"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2002년 민영화 이후 KT가 보인 행보가 좋은 예다. KT는 삼성과 달리, 이른바 '오너'가 없다. 지분이 특정인에게 쏠려 있지 않고 잘 분산돼 있다. 그래서 '주주 친화 경영'이 잘 이뤄졌다. 배당 성향도 높았다. 꾸준히 50%대를 유지했다. 이익 절반을 주주들에게 나눠줬다는 뜻이다.
민영화 이전에 매출액 대비 5.3%였던 연구개발비는 민영화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설비 투자 역시 매출액 대비 20%대에서 15%대로 줄었다. 대신 마케팅 비용은 늘었다. 자사주 소각 등 오로지 주가 관리를 위한 일에 많은 돈을 썼다. 통신 요금도 높게 유지됐다. 대대적인 인력 구조 조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 요컨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했고, 당장의 현금을 확보하는 데는 적극적이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실패했다. 주주들을 만족시키려면, 그래야 한다.
결과는 다들 아는 대로다. 고배당 정책으로 유명하던 KT가 지난해에는 배당을 아예 못했다. 수익이 악화된 탓이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을 꺼내려 했다는 옛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지나치게 높은 배당 성향은 노동자를 울리고 소비자를 찌푸리게 한다. 그리고 끝내는 주주의 미소도 거둬간다.
'황제 경영'은 이제 불가능
'이재용 체제 삼성'이 KT처럼 될 가능성은, 물론 거의 없다. '오너'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 친화 경영'에 따른 부작용을 전망하는 데는 힌트가 될 수 있다. KT가 겪었던 일 가운데 일부는 삼성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건희 체제 삼성'에서 핵심 키워드는 '황제 경영'이었다. 미미한 지분만 갖고 황제처럼 군림한다는 것이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도 당당했다.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 세대에게서 배운 경영은 그런 것이었다. 대중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다. 대신, 권력과 통하는 인맥을 잘 관리해야 했다. '밀실 로비'가 필요했고, 비자금이 필연이었다. 2000년대 들어 높아진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는, 이 같은 '황제 경영'과 정면충돌했다. '1주 1표'라는 주주 자본주의 논리를 상식으로 배운 소액 주주들이 보기에, '적은 지분을 지닌 황제'란 형용모순이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이 이 지점을 겨냥해서 날을 세웠다.
'이재용 체제 삼성'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물론 대대적인 변화는 아닐 게다. '황제 경영', '밀실 로비'는 여전할 게다. 그러나 소액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대중과의 소통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아버지 시절과 다른 대목이다.
주주가 더 가져가면 약자의 몫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주주의 몫이 커지는 게 꼭 좋은 일인가'라는 질문은 '이재용 체제 삼성'에서 더 중요해진다. 재벌 개혁 운동의 방향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남길 수 있는 이익은 정해져 있다. 누군가가 전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면, 다른 누군가는 더 적게 가져가야 한다. KT가 그랬던 것처럼, 주주의 몫이 커지면 협력 업체나 노동자의 몫은 줄어들 수 있다. 아무래도 주주보다는 협력 업체나 노동자 쪽이 약자에 가깝다. 물론 고액 연봉을 받는 삼성 정규직이 삼성 주주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주주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겹친다. 그러나 비정규직 등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또 이해관계가 겹치는 경우에도, 월급 털어 주식 사는 소액 주주와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자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당연히 후자에 더 힘이 실린다.
문제는 결국 사회적 힘의 관계다. 배당 성향을 높이게끔 하는 힘은 있다. 엘리엇을 포함한 투기 자본의 공격이다. 실제로 입증했다. <한겨레> 기사대로, 엘리엇이 나서니까 주주의 몫이 늘어났다.
반면, 협력 업체의 납품 단가나 임금을 올리게끔 하는 힘은 없거나 약하다. 협력 업체는 목소리 낼 통로가 없다. 삼성 노동조합 역시 존재감이 없다. 삼성이 낸 이익을 나누는 칼자루를 쥔 손은 많지가 않다.
그나마 힘을 쓰는 건 총수 일가 아니면 투기 자본이다. 지금은 이 둘의 싸움이다. 그러나 다들 이 싸움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협력 업체와 노동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몫은 조용히 줄어든다. 삼성과 엘리엇의 격렬한 싸움에서 누가 이기건, 별로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고 보는 건 그래서다.
이재용 체제 삼성, 어디로 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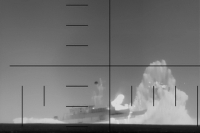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