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트위터에 "그곳(한국)에 있는 동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것(트윗)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가 당일 오전 떠올린 아이디어를 문장화했다.
세계가 갑자기 들썩였다. 여론의 관심이 한반도로 향했다. 둘은 다음 날(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역사적 장면을 연출했다.
발화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수신자는 김정은 위원장이었다. 굳이 해당 트윗의 송수신자를 하나씩만 정리하라면 그렇다. 이 메시지는 온 세계 트위터리안이 수신했다. 트럼프의 몇 줄짜리 단문은 곧바로 전 세계에 퍼졌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언론은 한 발 늦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미 트위터리안이라면 모두가 아는 내용을 뒤늦게 기사화했다. "트럼프가 29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트윗을 올렸다."

유독 한국에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 칭한다. 영미권에서는 소셜미디어라 칭한다. 일견 엇비슷해보이는 단어이지만, 이용자를 규정하는 양상이 다르다.
SNS란 곧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는 '서비스'일뿐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이 단어에서 이용자는 여전히 파편화한 개인이다. 가치 있는 정보의 발화자로 규정되지 않는다.
단어 '소셜미디어'의 맥락은 다르다. 이용자 개개인이 곧 미디어다. 가치 있는 발화자다. 한 트위터리안이 올린 메시지가 곧 뉴스며, 페이스북 이용자가 정리한 문장이 논평이고, 유튜버의 먹방이 가치 있는 방송 콘텐츠가 된다.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 단어인가. 후자다. 트럼프의 트윗이 이를 생생히 입증한다. 과거였다면 트럼프의 발화와 김정은의 수신 사이에 언론이 끼어들어야만 했다. 그래야 대중이 둘 사이를 오간 메시지를 알아챌 수 있었다. 이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미디어가 됐다. 언론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해당 트윗을 재정리한 기사보다 빠를 방법이 없다.
트럼프는 오래 전부터 트위터로 정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트위터로 정치만 하지 않았다. 스스로 미디어가 됐다. 그가 미국 언론을 공격하는 장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 언론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미 우리는 숱한 소셜미디어가 언론을 대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재미있는 홍보로 주목을 받은 충주시청, 부산경찰청이 직접 생산하는 정보를 대중은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고 있다. 삼성, 넷플릭스, 노동조합이 직접 생산한 정보가 곧바로 페이스북, 트위터를 타고 수신자에게 가닿는다. 방송사의 드라마를 유튜버들이 대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유튜버는 물론 우리 자신이다.
가치 편향, 정보 편향이 끼어드는 건 물론 맞다. 재벌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골라 팔로어에게 전달할 것이며, 경찰청이 자신의 부조리함을 직접 고발하는 트윗을 올리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보 편향성은 미디어가 지배하던 시절에도 있었다. 언론을 향한 대중의 신뢰도는 원래 그리 높지 않았다. 지금 대중은 지극히 자신의 가치관에 맞다 여겨지는 송신자를 골라 팔로우하며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보를 골라 수신한다. 이 상황에 ‘언론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언론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끼어들 자리는 넓지 않다.
미디어 플랫폼 혁명이 언론에 묻고 있다.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태 제기된 답안은 모두 설자리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혁신보고서에 한국 언론이 관심을 기울인 게 2014년의 일이다. 그 사이 언론 기업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성공 사례'는 제프 베조스가 돈을 투입해 기자를 대거 잘라내고 경영 관리자를 충원한 <워싱턴포스트> 사례 정도가 유일했다.
한국 언론이 따르기 쉬운 길은 아니다. 한국의 어떤 미디어 전문가도 한국 언론이 나가야 할 길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한다. 자본력이 취약하고 취재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으며 직원 재교육 능력도 취약한 한국 언론은 대중이 스스로 언론이 된 현실에서 여전히 출입처 문화 등 예스러움에만 기대며 천천히 가라앉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답이 없다면, 일단은 대중을 미디어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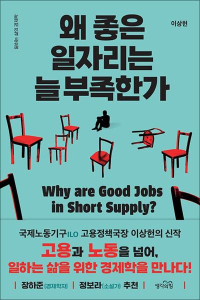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