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끼니를 집 밖에서 해결하던 독신 시절, 늘 전전하던 곳은 순대국집과 뼈해장국집 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순메밀 100%'를 지향하는 막국수집이 생겼다. 구수한 메밀향과 슴슴한 양념 맛에 반해버렸다. 지인들에게 '초(超)동네급 맛집'이라며 자랑했지만 이 가게는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망했다. 그 자리에는 또 그저 그런 순대국밥집이 하나 더 들어섰다.
망한 그 집은 순메밀면을 사용해 그런지, 메밀 막국수 한 그릇 값이 웬만한 고깃국보다 비싸긴 했다. 그러고 보면 막국수이든 잔치국수이든 (다소 예외적 존재가 된 '평양냉면'은 제외하고) 국숫집은 늘 다른 메뉴에 비해 가격이 싸야 경쟁력이 있고 오래 살아남는 듯하다. 단골이 채 되지도 못하고 애정하던 식당이 사라진 황망함은 '왜 사람들은 작은 차이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그리도 아까워할까'라는 푸념이 되어 터졌다.
이런 경험 때문일까. 변혜정·안백린의 <불편한 레스토랑>(파람북 펴냄)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고 무릎을 쳤다.
이 책은 여성학자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변혜정 박사와, 영국 유학파 의학도였던 그의 딸 안백린 씨가 서울에 '비건(vegan) 파인다이닝'을 지향하는 식당을 차리고 운영하며 겪은 경험담과 단상을 에세이 형식으로 묶어냈다.
"요리를 못 하기에 '알약으로 끼니가 가능하면 그거 먹겠다' 쪽이기도 했"다는, "택시 운전사는 생각해본 적 있지만 음식업은 생각지도 못했다"(19쪽)라는 변 박사가 메인 서버(지배인), "한때 돼지갈비를 누구보다 좋아했"으나(168쪽) "'시체보관소'라고 냉장고의 고기를 버리던, 고기를 먹는 아빠를 강하게 비판하던 딸"(34쪽)이 셰프(주방장)를 맡았다니, '이 식당 과연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채소 음식' 자영업자가 소도 사람도 지구도 함께 살리는 상호 상생의 꿈"(5쪽)을 실현하고자, 식당을 "지구에게는 턱없이 친절하지만 손님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공간"(5쪽), "요리에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엉뚱 모녀의 '불편한' 공간"(14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비건 파인다이닝이라는, 한국에서는 아직 '실험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도전에 대한 이런저런 비아냥에도 이들은 '쿨하게' 응답한다.
특히나 여성학 연구자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정부 공공기관장을 맡기도 했던 변 박사가 '음식 장사', '와인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니 주변에서 우려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 우려는 상당 부분 근거 있는 것이었음이 책을 보면 짐작이 가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전공에 대해 "페미니스트, 여성학은 2000년대만 해도 지성인은 알아야 할 상식 이상으로 이해됐으나 지금은 '꼴페미'라는 말로 비판받는, '브로커'처럼 나쁜 가치를 가진 말로 유통되고 있다"면서도 그런 세태에 대해 "성폭력은 범죄로서 감옥에 가야 하나 성평등은 안 되고, 저출산은 문제이나 페미니즘은 몰라도 된다. 이런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거침없이 비판한다.
이런 그가 "손님들과 부딪치며 장사하는 일은 배운 사람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과거의 태도로는 절대 할 수 없었다"며 " 나는 교육자로서 수강자와 상호 평등하게 강의한다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평등하지 않았다. 특권의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장사는 손님과 평등을 넘어 때로는 그들을 모시는 일"(12쪽)이라고 고충 섞인 성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굳이 '페미니스트'나 '비건'이 아니라도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고민할 문제, 이를테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도 접할 수 있었을 '장사' 자체에 대한 고민도 상당한 분량이 담겼다. 비건 음식을 파는 여성학 연구자이든, 고깃집을 하는 금쪽이 청년이든 비슷한 고충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리라.
왜 채소는 한우보다 비싸면 안 되나?
저자들은 "(가성비를 생각하면) 비건은 미친 짓"이라는 직원의 푸념(256쪽)을 뒤로 하고 "연시를 5시간 동안 저온조리하면 참치 같은 식감을 만들 수 있다"(18쪽)거나 "이 당근이 섹스보다 좋다며 'Better than Sex'라고 작명"된 당근 요리를 개발하는(176쪽) 등 비건 요리 연구에서 여러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다.
채식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담겼다. "맛있게 하기 위해 노동력을 많이 써서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비건을 주장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거나 "맛있게 하기 위해 5시간 저온 조리로 가열기를 오래 쓰며 탄소를 방출하는 것은 과연 옳을까?"(185쪽)는 등의 의문이다.
비건 레스토랑이라는(이제는 '비건임을 굳이 내세우지 않는 식당'을 표방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지만) 정체성 규정은 필연적으로 "'고기, 생선, 과일, 채소'라는 재료의 위계"(260쪽)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다.
서양에서라면 트러플(송로버섯), 한국에서라면 자연산 송이버섯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항상 고기는 '비싼 음식', 채소는 '싼 음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습적 편견에 불과한 게 아니냐고 저자는 날카롭게 묻는다.
가정에서 음식을 주로, 또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맡아 만드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폭풍 공감'할 얘기다. 꼭 정치적이거나 환경론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소화 기능상의 문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채소 요리(라기보다는 채소 반찬)들을 많이 만들어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때문에 "원가가 싼 채소는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한우만큼의 비용을 받을 수 없"고, "'노동력을 고려하면 이 채소요리가 절대 비싼 게 아니다', '제값도 안 되는 비용이다' 아무리 외친다 한들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한다."(22쪽)
저자는 이에 대해 "이건 정말 구조적 문제다"라고 여성학·사회학 연구자들의 '클리셰'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고기와 채소 간의 '식재료 서열화'가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은 거의 접한 바 없기에 그마저도 신선하게 다가온다.
"사람들은 비건이든 아니든 취향이니 고민할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음식은 개인적 취향 이상의 그 무엇, 즉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165쪽)"이라거나, "음식의 가격이 매겨지는 과정은 한국의 식문화를 대변한다.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 것처럼, 무엇을 귀하고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 역시 그 사회의 문화 (260쪽)"라는 통찰 또한 그렇다.
참고로 식당에서 저자가 가슴에 달고 다니는 명찰에는 'Ph.D'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연구'란 직업이며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묻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태도, 삶에 대한 자세이기도 하다는 점을 새삼 되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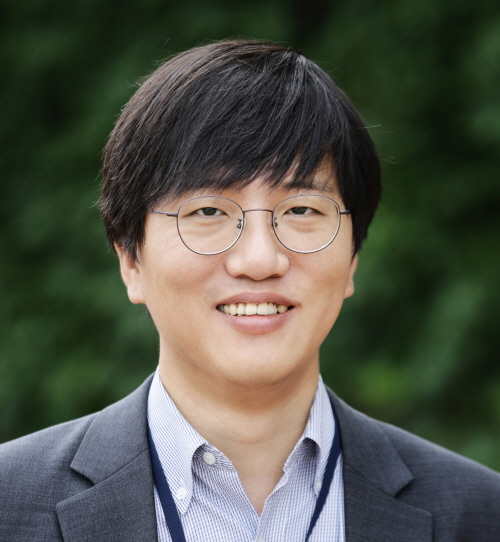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