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종전 직전의 5개월 동안에만 무려 4만 명이 죽었다. 이 기간 동안, 유엔은 내전에 개입해 양측을 중재하기는커녕, 현지에 파견돼 있던 직원들마저 철수시키며 사실상 두 손을 들고 있었다. 스리랑카 정부군이 타밀족 반군과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유엔이 못 본 척 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참상은 타밀 반군이 기록한 영상 등을 통해 서방에도 알려졌고, 큰 충격을 안겼다. 아래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담은 거의 유일한 한국어 기사 가운데 일부다.
"비디오 찍지 말고 어서 벙커로 들어오라고! 그걸 찍어 뭘 하려는 거야? (어차피) 저들은 우릴 전부 죽이고 있는데…"
화면 속 한 여인이 카메라맨을 향해 흐느낀다. "아빠"를 부르며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소리를 타고 "신이여, 제발 아이들을 구하소서…"라는 여인의 처절한 기도가 흐른다. 그러나 기도는 폭격 소음에 놀라 "엄마"를 지르는 아이의 비명에 묻히고 만다. 깊이 1미터나 될까? 허공 뚫린 벙커 안으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몸을 구겨 넣고 있다. 벙커는 지금 생존 구덩이가 되고 있다.
2009년 초 스리랑카 내전 막바지 이 섬나라 북부에서 벌어진 학살의 한 순간이자, 지난해 6월 영국 채널4 방송이 방영한 다큐 <스리랑카의 킬링필드>의 한 장면이기도 하다. (중략)
스리랑카 정부가 유엔과 구호단체들에게 '북부를 떠나라'고 명한 게 2008년 9월이다. 도로를 막아선 주민들의 시위를 뒤로한 채 정부의 소개령에 응하던 유엔 차량들은 줄줄이 떠나버렸다.
"당신들을 보낼 수 없다. 제발 여기 머물러 우리의 고통을 목격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먹을 것, 거처에 대해 신경써달라 말하지 않겠다. 여기서 다만 목격해 달라고…."
유엔 빌딩 밖에서 '목격해 달라' 호소하던 힌두 사제의 시위도 떠나는 차량을 막지 못했다.
독립적 관찰자가 모조리 철수한 채 가속도를 밟아가던 전쟁. 특히 반군영토의 수도였던 킬리노치가 함락된 2009년 1월 2일부터 종전이 선언된 2009년 5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 벌어진 전쟁 막바지는 흔히 '목격자 없는 전쟁'(War Without Witness)이라 불린다. 하여, 전쟁터에 갇힌 수십만 타밀족 스스로가 목격자였고, 희생자였으며 기록자 노릇까지 했다.
그러나 다큐의 밑천이 된 반군 영상도 5월 12일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이후 종전일까지 최고조에 이르렀을 학살, 암흑 속으로 빠질 뻔한 그 며칠 간의 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학살 가담자들의 손을 타고 나왔다. 정부군은 반군 포로와 민간인들을 고문, 총살했고, 나체 여성 시체를 트럭에 실으며 '기념 촬영'하는 광기를 보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전쟁범죄 현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열심히 돌려댔다. '스리랑카의 킬링필드'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관련 기사 : "엄마~" 아이들 비명 위로 폭격, 33만명의 지옥)
유엔이 스리랑카 내전에서 '기권'한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낳았다. 반 전 총장이 언론으로부터 '투명인간', '어디에도 없는 남자' 같은 혹독한 비난을 듣게 되는 데에는, 사무총장 임기 제1기 중반에 발생한 이 사건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물론 반 전 총장이 문자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인도 고위 외교관 출신인 비제이 남비아를 특사로 급파했다. 하지만 남비아를 고른 게 적절한 인선이었느냐는 비판이 있다. 특히 남비아는 2009년 5월 17일 '백기 투항 학살' 사건에서, 사전 중재를 요청받고도 아무 역할을 못 했다. 이 때문에 남비아 본인이 전쟁 범죄 혐의로 처벌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왔던 실정이다.
'백기 투항 학살' 사건이란? 내전 종반 국면에서, 궁지에 몰린 타밀 반군 지도자들은 정부군에 투항하려 했지만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반군 지도자들은 그래서 영국 <선데이 타임스> 기자였던 미국인 마리 콜빈(☞관련 기사 : 전쟁터에서 한쪽 눈 잃은 종군기자, 시리아에서 숨지다)에게 자신들의 신변 안전 보장 방법을 궁리해 달라고 했다. 콜빈은 남비아에게 전화를 했고, 남비아는 스리랑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다시 콜빈에게 전화해 '백기를 들고 투항하기만 하면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한다'고 말을 전했다. 그러나 남비아의 장담에도, 투항하려던 반군 지도자들은 정부군에 의해 사살됐다.
이처럼 유엔의 스리랑카 대응이 명백한 실패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엔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량 살상이 벌어질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반기문은 평화유지·구호를 맡을 유엔 직원들을 현지에 파견하는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유엔 직원들은 눈 앞의 참상을 보고 있어야만 했다. 이 일은 유엔 직원들의 임무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고, 직원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증언했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유엔 전문기자 "반기문은 유엔을 여러 측면서 퇴보시켰다")
반 전 총장은 그러나 2009년 6월 국내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스리랑카 사태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상당히 강한 성명을 22번이나 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도, 스리랑카 현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같은 자세를 유지할 강단은 없었다. 스리랑카 언론 <콜롬보 가제트>의 지난해 9월 보도다.
유엔은 스리랑카 내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다시 한 번 인정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스리랑카 방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엔은 스리랑카 내전 대응에서 실패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가 유엔의 실패와 향후 취해야 할 조치들을 지적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는 실종자나 사망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유엔의 실패에 대해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유엔 사무총장의 내부 검토위원회(IRP)는 내전 막바지인 2008년 9월 유엔 직원 철수를 포함한 유엔의 체계적 실패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의 유엔 직원 철수는 '주둔에 의한 보호'라는 유엔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유엔 직원이 주둔하기만 해도, 현지인들이 비인도적 행위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는다는 뜻) 이는 수만 명이 사망한 몇 달 간의 격렬한 무장 교전 직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시리아 내전 중재 등,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경험한 다른 '실패'들은 대부분 유엔 자체의 한계이거나 반 전 총장의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통상적인 비판을 받는 데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스리랑카 내전 대응과, 아이티 콜레라 사태(☞관련 기사 : 9000명 사망 콜레라 대재앙, 반기문의 '사과'에는 6년이 걸렸다)는 이런 '통상적' 비판으로만 넘어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패를 인정하는 반 전 총장의 태도에서 도덕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공과(功過)'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시리즈 목록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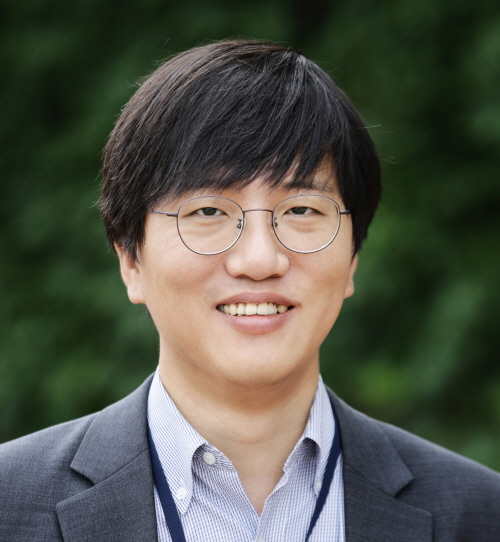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