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장관은 12일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개성공단의) 실상,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그냥 피상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북한의 돈줄을 막는 것이 국익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이 갖는 심리적 안전판, 군사적 안전판, 경제적 안전판, '돈 안 드는 통일'로 가는 안전판의 역할에 대한 실상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가 이런 즉흥적, 감정적 정책 결정의 배경 아니겠는가"라며 "매일 아침 서울 광화문에서 개성으로 출발해 DMZ를 넘던 출근버스 2대가 10년만에 멎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희망의 문이 닫힌 것이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작은 통일'의 엔진이 멈춘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개성공단 설립 당시를 회상하며 "2004년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갔을 때 미국은 '속도 조절'을 강하게 주문하는 상황이었다. 2004년 8월에 미국에 가서 네오콘 수장인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만나 지도를 들이밀고 '개성공단 위치가 어디인 줄 아시나? 6.25 때 남침로이자 유엔군이 북상했던 전략적 요충 거점이다. 북한군 6사단, 64사단, 포병여단, 탱크부대, 포 진지 등 6만 명의 병력과 중화력이 밀집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남쪽의 공단으로 내주겠다는데 왜 '속도 조절'을 하라고 하느냐'(고 럼스펠드를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한미 동맹군의 가장 큰 취약점이 (전역의) 종심이 짧다는 것으로, 휴전선에서 서울은 60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결정적 약점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조기 경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돈과 물자와 장비와 사람을 쓴다. 그런데 이 중화력 밀집 지역의 가로·세로 8킬로미터 2000만 평을 남쪽에 경제 영토로 내준다는데 왜 '속도 조절'을 하라는 말이냐"고 자신이 당시 럼스펠드에게 역설했다면서 "미국이 어쨌든 정책 방향을 바꿨고, 그래서 2004년 말 제1호 공장부터 124개까지 쭉 확대돼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 북한이 개성 공업지역을 다시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한 것은 6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던 자리를 6만 명의 병력과 화력이 밀집한 지역으로 바꿔놓은 것"이라며 "그러면 위험해진 것은 서울이고, 수도권이다. 이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며 평화를 향해서 어떤 진전이 있는지, 박 대통령은 왜 이런 무모한 정책 결정을 했는지 우리 국민이 물어야 한다"고 따졌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남북 경협이 중단된 이후 북중 무역이 크게 늘어나 80억 달러 규모의 물자와 돈이 오고 간다"며 "80억 달러의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1억 달러의 임금(지급)을 막는다고 해서 핵 개발을 막는다는 발상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지금 자기 생각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과거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 썼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2002년에 만나고 오면서 '아무리 적대적인 상대방이라도 만나서 대화하면 풀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소통이나 절차도 없이 이런 식으로 대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본인이 자서전에 써놓고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자서전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은 한국의 전통적인 밥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서양식으로 처음에 전채가 나오고, 또 수프가 나오고, 빵이 나오고 이렇게 차례차례 나오는 방식으로는 핵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밥, 국, 김치, 찌개 등을 전부 다 상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해결하는 한국 밥상처럼, 북이 왜 핵 개발에 매달리는지 의도와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포괄적 해법'"이라며 "과연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밥상론'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적이 있었던가"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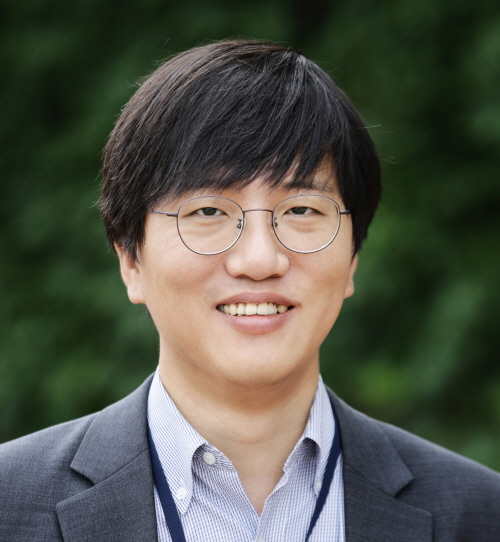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