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일본 3개국 정상이나 고위관리 회동 등 국제행사가 있을 때 그간 '한중일'과 '한일중'을 섞어 써왔던 관행에 대해, 대통령실이 앞으로는 '한중일'로 공식 표기를 통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북아 3국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동북아 3국 표기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민·관을 가릴 것 없이 '한중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중일 정상회의가 별도 회의체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개최국 순서에 따라 '한중일'과 '한일중'을 병기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2018.5.1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공식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약 4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2019.12.24.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공식브리핑) 등 '한일중' 표기를 일부 사용한 전례가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등 한중일 정상회의와 무관한 경우에도 '한일중'이라는 표기를 사용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일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북미'보다 '미북', '한중일'보다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이를 예전 관행대로 '한중일'로 되돌리겠다고 한 것이어서, 대중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현 정부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통상 국제행사 등에서 여러 나라의 이름을 병기할 때는, 우리나라 국호를 가장 앞에, 동맹국과 우호관계국을 그 다음에, 비수교국이나 적성국가를 뒤쪽에 쓰는 것이 그간 외교가나 관가의 관행이자 비공식 원칙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때문에 냉전 시대에 2차대전 승전국 4개국을 표기할 때는 '미영불소'로, 남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을 표기할 때는 '미중러일' 또는 '미중일러' 등으로 표기해 왔다. 과거 한국을 식민지배한 일본을 '가장 먼 나라'로 볼 것인지, 냉전시기 공산진영을 이끌었던 러시아, 즉 구 소련을 가장 후순위로 부를 것인지 등은 당시의 국제정세나 해당 행사의 성격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2003년 첫 6자회담 개최 당시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반대 끝에 가까스로 6자회담 당사국에 합류했고,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만큼 '미중일러'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이 불거진 국면에서는 '미중러일'이란 표기기가 주로 진보진영에서 많이 쓰였다. 반대로 보수진영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의식한 듯 '미일중러'라는 표현을 더 선호해 왔다.
북한의 경우는 여전히 군사적으로는 적대의 대상이지만, 남북관계는 같은 민족이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1991 남북기본합의서)임을 고려해 통상 타국보다 앞에 표기해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역시 '러북', '미북' 등의 표현으로 대북 적대감을 표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부터가 지난 2023년 9월 뉴욕 유엔총회 연설 당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겨냥한 도발"이라고 했고, 같은해 윤석열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도 "러북관계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동북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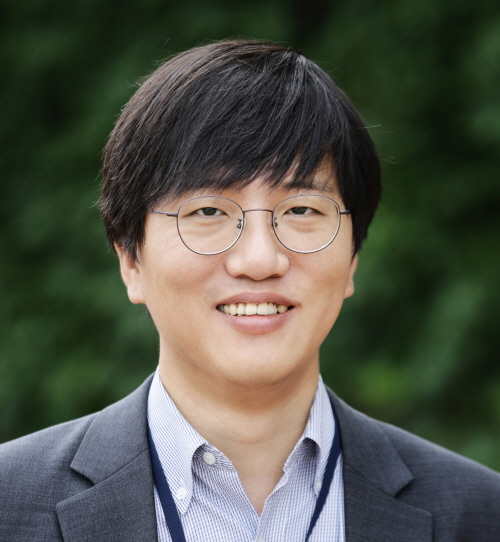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