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짓는 농사' 염농(焰農). 정확하게는 불로 짓는 '그릇 농사'라는 의미다. 현장 활동가로, 노동잡지 편집장으로, 서울·경기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동의 세계에 근 30년을 몸담았던 신금호 선생이 은퇴 후 도예가의 길을 걸으며 사용하는 아호다.
1944년 생인 신 선생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엘리트의 영예를 좇지 않고 '조국 근대화'가 빚어낸 불의에 몸과 머리로 맞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길로 향했다. 팔순을 바라보는 지금도 '그릇빚음'을 잠시 멈춘 시간에 골프장 미화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다.
최근 주변의 권유로, 손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서전에 꾹꾹 눌러 담았다. 젊은날 정면으로 마주했던 군사정권 시대상, 사회에 나와 겪었던 척박한 노동 현장의 기억을 농사짓듯 기록했다. 시대에 저항하고 자연에 순응한 어느 '백발 노동자'가 견뎌 살아온 이야기를 연재한다. 편집자
나는 빈 농가 작은 터의 흙을 파내어 그 자리에 한그루 꽃사과를 심었다. 고추와 상추, 쑥갓도 심었다. 그리고 뒷밭에서 경사져 올라간 곳에 자리잡은 닥나무 그늘 밑에 긴 판자를 깔고 누워 흙내음, 흙바람 맡는 게 그리도 좋았다.
마을 젊은 농부 가족 셋과도 마음이 통했다. 유덕상, 고태수, 그리고 유연상 부부. 그들은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주었다. 우리까지 네 가족이 모여 막걸리나 양동이에 봄나물을 가득 넣은 비빔밥을 먹노라면, 맛도 맛이려니와 모두의 말솜씨가 장관이었다. 아내인 김 화백은 젊은 농부부들의 능란한 말솜씨를 재치와 순발력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려 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끝내 비봉산 아래로 햇살 드는 언덕에 있는 돌투성이 밭 5백 평을 사들이고 집을 지어 살기로 했다. 조금은 경사져 있었으나 전체가 네모지고 비교적 평탄했다. 집터는 마을 중심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한 곳이었다. 돌밭 모퉁이에는 덩치 큰 소나무 세 그루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햇살 드는 돌밭 언덕에 선 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에서 빚은 구호 세 가지, 개척자로서의 '프론티어' 정신, 탐험가로서의 '파이오니어' 정신, 봉사자로서의 '발룬티어' 정신이 온전히 자리 잡았다.
당시 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떠나 수원에 있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였다. 기간제 고위 공무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빈손의 맨몸이겠지만, '2P1V' 정신으로 두려움이 없었다.
IMF 위기가 우리나라와 지구 온 곳을 옭죄던 때였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가고자 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사들인 돌밭을 대지와 농지로 나누어 등재하고, 먼저 살림집짓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맨손과 호미만으로 뒹구는 돌과 파묻힌 돌들을 걷어냈다. 소나무 옆으로 땅을 파니 지하수가 기세 좋게 쏟아져 나왔다. 돌담을 쌓고 흙으로 다지고는 김 화백이 설계한 집짓기 구상에 따라 건축자재를 구매했다. 집 골격을 완성한 후엔 외벽은 붉은 내화벽돌로 두르고, 지붕 위로는 등짐지고 청석을 날아다 깔았다. 김 화백과 내가 해냈다.
29평이었지만 살림집이 완성되니 천정이 높고 넓어 마음까지 뻥 뚫렸다. 큰방 둘, 작은방 하나, 부엌 겸 식탁을 놓은 공간 하나. 서쪽으로 낸 큰 창 밖으로 산허리와 넓은 하늘이 보였다. 동쪽으로 낸 창문 밖으로는 고른 논이 개천 뚝길로 이어졌고, 멀리 산등성이 뒤로 보이는 차령산맥 등줄기 위로 하늘이 높고 넓어 보였다. 맑은 날 밤이면 하늘 위로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뚜렷했다.
마당 터가 넓었다. 돌밭에서 캐낸 돌들로 밭과 마당의 담장을 쌓았다. 김 화백이 설계한 40평 화실도 지었다. 안성 향토박이 젊은 건설업자의 도움을 얻었다. 넓은 화실 안에는 화구 외에는 아무런 기구도, 장식도 없었다. 마당 곁에 나무도 심었다.
이때 비로소 서울 서초동집을 팔아치우고 살림살이를 전부 옮겼다. 그때쯤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임기가 끝났으므로 나는 무직, 무일푼으로 나이 쉰을 넘긴 자유인이 됐다. 나는 지식인 출신 반(半)농군이었고, 아내는 여성 민중 화가였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과 서먹서먹하지 않았다.
그뿐인가. 해발 190미터 가량의 샛죽바위산 아랫녘은 나 말고는 아무도 밟는 사람이 없기에 모두가 내 땅 내 정원처럼 여겼다. 마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무런 제재나 간섭 없이 그 후로도 20여년 내내 홀로 산에 오르고 오솔길을 내어 사시사철 다녔다.
내 발, 내 손, 내 몸으로 밭도 일구고 가꿨다. 삽으로, 때로는 괭이로 밭을 고르고, 호미와 손으로 작은 밭을 정원처럼 가꿨다. 내 몸에는 흙냄새가 베어들었고 삽질, 곡굉이질, 호미질로 손가락 마디와 손바닥에 굳은살이 뱄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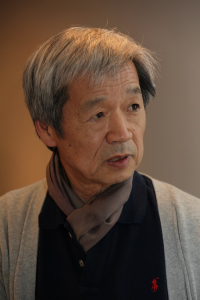




전체댓글 0